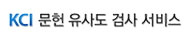Ⅰ.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상상 공간의 춤 그림’과 ‘풍속 공간의 춤 그림’이라는 시각 자료를 중층적으로 읽어 조선시대의 춤 문화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간 춤이 담긴 그림에 관심을 갖고 왕실 공간-관아 공간-사적 공간의 ‘춤 그림’으로 조선의 춤 문화를 파악하는 논문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이 연구는 후속 연구의 성격으로 ‘춤 그림’ 읽기의 네 번째 논문 이다. 앞선 세 차례 연구에서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여 춤 현장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그린 기록화만 다루었다. 즉, 춤 현장에서 주인공은 누구이며, 어떤 행사인가를 뚜렷이 알 수 있는 춤 그림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했다. 그러나 수많은 도록을 뒤지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범위 외에도 상당수의 춤 그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글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상상 공간의 춤 그림과 풍속 공간의 춤 그림 이 연구대상이다. 현재 어느 정도 지형으로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의 춤 그림이 존재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그림 자료를 최대한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서술했다. 구체적 인 연구대상으로, 상상 공간의 춤 그림은 소설 『구운몽』ㆍ『춘향전』ㆍ『곽자의전』을 그린 그림과 신화 「요지연도」와 「감로탱」을 그린 그림이다. 풍속 공간의 춤 그림은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로 범주화했다. 첫째, 도시의 풍경을 그린 「태평성시도」, 둘째 노동 그림을 그린 「세시풍속도」ㆍ「풍속도」, 셋째 개인의 일생을 그린 「평생도」ㆍ「회혼례도」, 넷째 풍류가 담 긴 「풍속도」ㆍ『기산풍속도』ㆍ『혜원전신첩』ㆍ『단원풍속도첩』, 다섯째 굿 그림을 그린 『무 당내력』ㆍ「무녀신무」ㆍ「무녀신축」 등이다. 풍속 공간 중에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는 사적 공간의 춤 그림으로 이전에 다루었으므로 제외한다.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의 춤 그림은 특정 공간에서 실제 춤춘 모습을 사진 찍듯이 재현 한 것이 아니라, 화가가 경험적으로 머리에 떠오른 춤 이미지에 상상력을 가미해서 전형적 인 모습으로 그린 것이다. 조선 사람들이 지닌 춤 관념과 문화가 화가의 손길을 통해 그림 에 반영되었다. 춤 그림 자료를 통해 단편적인 문헌 기록을 보완하여 조선시대 춤 역사를 서술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특히 궁중이나 관아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춤에 비해, 민속과 가까운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의 춤은 관련 문헌 기록이 드물기에 춤 그림은 자료 적 가치가 높다.
연구방법은 도상연구와 문헌연구이다.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의 춤 그림에 관한 구체적 인 연구 방법으로 우선, 관련 그림을 최대한 찾아낸다. 어디에 어떤 춤 그림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앞선 연구에서 자료를 찾았던 것처럼 출판된 도록이 방대하게 집적된 국립중 앙박물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여 춤 그림을 찾아낸다. 다음으로 사이트를 활용하여 국립 중앙박물관과 지역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를 검토하여 추가로 춤 그림을 찾아낸다. 또한 관 련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춤 그림도 추가로 확보한다. 그림이 집적되면 다양한 각도에서 읽기를 시도한다.
춤 그림에서 읽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누가 공연자와 관객인가를 파악한다. 상 상 공간의 춤 그림에서는 실재하는 인물이 아닌 상상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 존재가 상징하는 것을 밝히고, 신분이나 직업군 등을 파악한다. 둘째로 어떤 시기에 공연된 춤인 가라는 시간적 배경을 파악한다. 상상의 시간이라면 어떠한 시간이나 시기로 설정된 것인 가를 알아본다. 셋째로 춤추는 공간이 어디인가, 공간적인 특징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넷째로 무슨 춤을 추고 있는가, 춤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다섯째로 춤의 형식적 면모를 파악한다. 여섯째로 왜 상상 공간에서 그 춤을 추도록 그려졌는가, 춤 그림을 그린 목적을 조선시대 춤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에 그려진 춤을 폭넓게 조망하려고 했던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춤 그림 자료들을 섭렵하고자 했으나, 한 그림에 다양한 판본이 있는 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 둘째, 제한된 지면에 방대한 그림 자료 를 소개하였기에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쳐나가지 못하고 얕고 넓게 다루었다. 셋째, 춤 그림 에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자 했으나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네 차례의 논문을 단행본으로 묶어서 낼 때 보완하기로 한다.
Ⅱ. 상상 공간의 춤 그림
1. 소설 그림의 춤: 「구운몽도」ㆍ「춘향도」ㆍ「곽분양행락도」
“이야기는 말로 그린 그림이요, 그림은 종이 위의 이야기다”(정병설 2006, 380). 그림 속에는 춤의 이야기도 펼쳐진다. 춤 그림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이 장에서 논의 할 ‘상상 공간의 춤 그림’은 소설과 신화 이야기를 그린 것 중에 춤이 등장하는 작품이 대상이다. 『구운몽』ㆍ『춘향전』ㆍ『곽자의전』의 소설을 그린 그림에서 춤이 나타나는 부분 을 살펴보겠다.
1) 「구운몽도(九雲夢圖)」의 검무
「구운몽도」는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의 소설 『구운몽(九雲夢)』을 그린 그림이다. 『구운몽』은 주인공 성진이 육관대사의 명으로 용궁에 다녀오면서 여덟 선녀를 만난 뒤, 그녀들을 잊지 못해 인간으로 태어나는 벌을 받고 당나라의 양소유로 태어나 팔 선녀(진채봉ㆍ계섬월ㆍ정경패ㆍ가춘운ㆍ적경홍ㆍ난양공주ㆍ심요연ㆍ백능파)를 다시 만나 부귀를 누렸으나, 노년에 다 부질없음을 깨달아 불교에 귀의한다는 이야기다(정병설 2010, 177). 『구운몽』은 최초로 민간에서 출판되었고, 최초의 베스트셀러 소설이었다(정병설 2010, 20). 소설의 인기는 「구운몽도」가 그려지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구운몽도」는 32점 이 전하는데 주로 8폭 혹은 10폭 병풍의 형태로 화풍이 다양하다(김은비 2015, 89).
「구운몽도」에서 춤이 나타나는 장면은 『구운몽』의 ‘낙유원(樂遊園)’을 그린 부분이다. 낙 유원에서 왕자 월왕은 양소유에게 기예를 겨루자고 제안한다. 월왕은 기예를 겨룰 네 미인 을 데려왔으나, 양소유는 계섬월과 적경홍 두 명만 있어서 기예를 겨루기가 불리하던 차에 심요연(沈裊烟)과 백능파(白凌波)가 수레를 타고 등장한다(정병설 2010, 74). 최고의 춤꾼 인 심요연과 최고의 연주자인 백능파가 기예를 펼치는 장면이 「구운몽도」에 그려졌다.
<도판 1>은 계명대행소박물관 소장 「구운몽도」의 6폭 병풍 그림 중 1폭이다. 검무의 관객은 북쪽 상석에서 붉은 복식을 입은 월왕과, 그 왼쪽 아래에 분홍 관복을 입은 양소유 였다. 작고 동그란 돗자리를 춤의 무대로 삼아, 심요연은 양손에 장검을 들고 검무를 춘다. 심요연이 옷자락을 날리면서 왼팔은 뻗어 머리 위로 검을 들고, 오른팔은 아래로 낮추어 검을 바닥으로 내린 모습이 역동적으로 그려졌다.
검무를 추는 심요연은 어떤 인물인가? 심요연은 양소유가 티베트(토번)를 정벌할 때, 양 소유의 첩이 되기 위해 구름을 타고 날아 온 자객이었다. 이때 심요연의 모습은 구름 같은 머리털을 올려 금비녀를 꽂고, 소매 좁은 전포에 패랭이꽃을 수놓고, 발에는 봉의 머리를 수놓은 신을 신고, 허리에는 보검을 차고 있었다(정병설 2010, 62). 양소유의 일곱 번째 여인이자, 뛰어난 검술을 지닌 심요연이 낙유연의 잔치에서 춤춘 장면은 『구운몽』에 다음 과 같이 묘사되었다.
월왕과 승상이 각기 허리에 찬 칼을 끌러주니, (심)요연이 소매를 걷고 허리 장식을 풀고 수레 위로 올라가 춤을 추었다. 칼이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하면서 사방을 휘젓다가 갑자기 멈추었는데, 미인의 붉게 단장한 얼굴과 칼의 흰빛이 어지러이 하나가 되어 봄눈이 복숭아꽃 위에 어지러이 흩날리는 듯했다. 춤추는 소매가 점점 급박해지더니 칼끝도 더욱 빨라져 서릿 발 같은 것이 장막 안에 가득했다. 그러다 마침내 요연의 몸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한 발 길이의 푸른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생기더니 쏴아하는 차가운 바람이 잔칫상 위로 불어왔다. 좌중이 모두 뼈가 시리고 머리카락이 쭈뼛해졌다. 요연이 배운 술법을 다하고 자 하다가 월왕이 너무 놀랄까 하여 그만 춤을 그치고 칼을 던졌다. 그러고는 월왕에게 두 번 절하고 물러났다(김만중 2013, 238).
『구운몽』에 쓰여진 심요연의 검무 솜씨는 신의 경지였다. ‘봄눈이 복숭아꽃 위에 어지러이 흩날리는 듯’한 부드러운 검무의 춤사위는 점점 빨라서 서릿발 같은 것이 가득 차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판 1>은 심요연의 검 무 장면으로, 오른편의 월왕은 그녀 의 춤을 ‘신묘한 경지’라 극찬하며 혹시 신선이 아닌가 묻고, 향후 궁녀 들에게 검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 했다(김만중 2013, 239).
「구운몽도」에 심요연의 검무가 그려진 이유는 당시 『구운몽』 독 자들에게 심요연의 검무가 인상 깊 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종대 정원 용(鄭元容, 1783-1873)의 과거 급 제 60주년인 회방(回榜) 잔치를 쓴 「뎡상공 회방긔록」에 “보기 좋은 검무 춤은 심요연의 쌍이런가(보기 조흔 검무츔은 시묘년의  이런가)”라는 대목이 등장한다(조경아 2016, 102). 잔치 자리에 서 기녀들이 보기 좋게 잘 추는 검무를 감상하며, 한글가사를 쓴 여성 화자는 심요연을 떠올렸다. 효녀하면 심청을 떠올리듯, 조선 사람들은 ‘검무’하면 곧장 ‘심요연’을 떠올렸던 듯하다. 이처럼 심요연은 검무 춤꾼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다.
이런가)”라는 대목이 등장한다(조경아 2016, 102). 잔치 자리에 서 기녀들이 보기 좋게 잘 추는 검무를 감상하며, 한글가사를 쓴 여성 화자는 심요연을 떠올렸다. 효녀하면 심청을 떠올리듯, 조선 사람들은 ‘검무’하면 곧장 ‘심요연’을 떠올렸던 듯하다. 이처럼 심요연은 검무 춤꾼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다.
정병설(2010)은 인생의 무상함을 꿈처럼 깨닫고 불교에 귀의한다는 『구운몽』의 독법은 잘못되었다며, 낭만적 사랑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구 운몽도」는 엄격한 도덕률에 눌리고 현실에 지친 조선인에게 환상, 개성, 자유, 조화를 나눠 주는 위로라고 평가했다(174). 심요연의 검무 그림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심요연은 등장부 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날아온 낭만적 인물이며, 뛰어난 묘기를 부려 검무를 추다가 몸 을 사라지게도 하고 검을 휘두른 자리에 푸른 무지개도 생기게 하며 찬 바람도 일으키는 신출귀몰한 존재였다. 「구운몽도」의 검무도 이를 반영하여 율동감 있게 그려졌으며, 자유 자재의 검술을 환상적으로 펼쳐낸다는 측면에서 ‘낭만성’을 드러낸다.
2) 「춘향도(春香圖)」의 승무(법고춤)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을 그린 <도판 2-1>의 「춘향도」는 경희대박물관 소장의 10폭 병풍이며 변사또의 생일잔치를 그린 7폭에 춤이 등장한다. 변사또는 주인공의 자리인 북쪽 위에, 초대된 사람들은 좌우에 그려졌다. 전주의 완판 84장본(이하 완판본) 『열녀춘향수절 가』에는 초대된 사람들이 자세한데, 가까운 읍의 수령들인 운봉의 장관,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원님이 차례로 모여들었다(송성욱 역 2004, 172). 지방관아의 잔치 때 손님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풍경이다.
춤 무대는 돗자리를 깔아 마련되었고, 돗자리 위에 설치된 작은 법고는 비스듬한 각도로 높이 걸렸다. 현재 승무 마지막에 치는 법고와 크기 및 형태가 유사하다. 흑장삼을 입은 기녀가 양손에 북채를 든 채 법고를 치고, 그 옆에 다른 기녀는 회색 장삼을 입고 서 있다. 장삼 밑으로 치맛자락이 흘러나왔기에 이들은 기녀임이 분명하다. 『춘향전』의 배경이 남 원이니, 남원 관아 소속의 기녀가 승무와 법고놀음을 하는 설정이다. <도판 2-1>은 법고를 치는 장면이지만 법고춤에 앞서서 승무를 추었으리라 추정되며, 옆에 선 기녀의 존재로 보아 쌍승무가 행해진 듯하다.
이 잔칫날의 춤을 『춘향전』에서 어떻게 기록했을까?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에는 “삼 현육각 풍류 소리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밝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 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송성욱 역 2004, 172)라고 하며 어떤 춤인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춤 장면 이 좀더 자세한 경판 30장본 『춘향전』의 본관 생일 장면은 다음과 같다.
과연 본관의 생일이 분명한지라…(중략)…인근 읍의 수령들이 차례로 앉은 후에 아이 기생 은 녹의홍상 입고, 어른 기생은 패랭이 쓰고, 늙은 기생이 인솔하여 좌우에 모셔 섰다. 양금, 거문고, 생황, 가야금 소리는 산호 채찍으로 옥반을 치는 듯, 입춤 후 검무(劍舞) 보고, 거문고 남창(男唱) 듣고, 해금과 피리에 여창(女唱)이라(송성욱 역 2004, 237).
경판본 『춘향전』에서는 본관 사또의 생신잔치 때 기생들이 입춤과 검무를 추었음만 언 급되고 <도판 2-1>에 그려진 승무는 말하지 않았다.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과 그림 「춘 향도」에 소개된 춤 종목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까? 『춘향전』에 언급된 입무나 검무가 아 닌 승무(법고춤)가 그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춘향도」의 화가는 관아 잔치에서 기녀가 춤 추는 장면을 그릴 때, 승무(법고춤)를 선택했다. 이는 화가가 한 가지 춤을 그릴 때 대표적 으로 승무를 떠올릴 정도로 당시에 승무가 인기 춤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남원 등 지방 관아의 잔치에서 기녀가 승무를 춤추고 법고 놀음을 하던 문화가 조선후기에 자리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승무의 복식이 검정색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도판 2-2>는 다나베 히사오(田辺 尙雄 1970)가 1921년 4월 12일에 경성 명월관(明月館)에서 영상 촬영을 위해 승무를 관람 하고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은 『중국ㆍ조선음악조사기행(中國朝鮮音樂調査紀行)』(1970) 에 수록되었는데, 승무를 추는 기녀는 흑장삼을 입었다(57). 다나베 히사오가 설명하기를, 승무의 복식은 흑색인데 비해 비슷한 형태인 예상우의무(霓裳羽衣舞)의 복식은 백색이라 했다(다나베히사오 2000, 202). 1921년에 기녀의 승무 의상은 흑장삼으로 인식되었다.
<도판 2-3>은 일제강점기 사진엽서에 등장하는 승무인데, 평양기생학교 출신의 기생이 흑장삼을 입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2009)에서 펴낸 『엽서 속의 기생읽기』에 소개된 일 제강점기 사진엽서 4점에서도 승무를 추는 기생은 흑장삼을 입었다(67-70). 승무가 담긴 조선후기 그림, 1921년 다나베 히사오의 사진, 그리고 일제강점기 사진엽서에 이르기까지 기생 승무의 장삼은 검은색이 주종이었다.

도판 3
「곽분양행락도」(Painting of Luxurious Life of Guo Ziyi) 1폭 부분. 19세기 중반.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50200 0000.do?schM=view&searchId=search&relicId=1246.
정리하면, 「춘향도」의 춤 문화사적 의미는 문헌으로 자세하지 않았던 조선후기 관아 소 속 기녀가 추는 승무(법고춤)의 존재와 공연 형태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과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흑장삼을 주로 입었던 승무 의상의 연속성을 보여준 것이다.
3)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의 춤
「곽분양행락도」는 당나라 소설 『곽자의전(郭子儀傳)』을 그린 그림이다. 중국 당나라 장 군이었던 곽자의(郭子儀, 697-781)는 분양군왕(汾陽郡王)에 봉해졌기에 곽분양으로도 불 렸다. 당나라 사람인 곽분양은 조선사회에서 ‘복록’의 표상이며 인간으로서 욕망을 모두 이룬 인물로 여겨졌다(최경환 2008, 271). 곽분양의 복록과 부귀, 자손 번창을 조선 사람들 도 소망했기에 궁중과 민간에서 「곽분양행락도」가 유통되었다.
<도판 3>은 19세기 중반에 그려진 「곽 분양행락도」 8폭 병풍 중 제1폭이며, 곽 분양이 손님 및 자손들과 잔치를 하는 장면이다. 주빈의 자리인 북쪽에 곽자의 가 앉아있고, 마당 양 옆에 자손들이 그득 하며 그들 가운데에 기녀가 홀로 춤춘다. 춤추는 기녀 양편에 기녀 연주자들이 서 서 연주한다. 기녀가 춤추는 무대는 네모 난 돗자리를 바닥에 깔아 마련되었다. 돗 자리 위에서 춤추는 기녀는 긴 소매와 옷자락을 나풀거리며 춤추는데, 춤추는 모습에서 중국풍의 율동미가 보인다. 곽 자의가 당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풍 으로 그려진 듯하다. 한양대박물관 소장 의 「곽분양행락도」는 「영고화(靈鼓畵)」 라 지칭했는데, 돗자리 위에서 두 명의 기녀가 서로 마주하여 춤추는 모습으로 그려졌다(고려대학교박물관 2018, 172). 즉 그림 판본에 따라 한 명이나 두 명이 춤추는 모습이었다.
조선 왕실에서 「곽분양행락도」는 복을 받는 의미를 담아 왕실 가례에 사용되었다(박정 혜 외 2011, 146). 숙종은 세자에게 「곽분양행락도」를 내려주며 “예로부터 만복을 갖춘 이로는 곽자의를 제일로 여기느니 아들, 사위, 손자들이 모두 앞에 섰구나. 이 같은 그림이 우연히 그려진 것은 아니니, 곁에 두고 보면서 만복과 장수를 누리라”라고 했다. 곽분양이 누린 부귀영화는 그가 쌓아올린 결과였기에 비판받지 않았다는 점을 숙종은 강조했다(김 홍남 2012, 72-73).
지금까지 소설을 그림으로 담아낸 세 작품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소설인 『구운몽』을 그린 「구운몽도」에서는 검무가, 『춘향전』을 그린 「춘향도」에서는 승무 (법고춤)가 그려진 사실은 두 종목이 민간에서 인기있던 춤이었음을 말한다. 중국 당나라 때의 인물로 부귀영화를 누린 대표적 인물의 이야기인 『곽분양전』은 「곽분양행락도」로 그 려졌는데, 독무가 등장한다. 소설을 그린 세 작품에서 춤이 그려진 배경은 모두 잔치자리 였다. 여기에 춤이 그려진 이유는 잔치에 춤이 빠질 수 없었던 당시 문화의 반영이자, 인생 의 즐거움과 흥겨움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려면 춤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신화 그림의 춤: 「요지연도」ㆍ「감로탱」
1) 「요지연도(瑤池宴圖)」의 춤
상상 공간 춤의 두 번째 범주는 신화 그림이다. 먼저, 중국 도교 신화 속 이야기를 담은 「요지연도」를 살펴보겠다.
「요지연도」는 생명을 관장하는 여신인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곤륜산 ‘요지(瑤池)’에서 주나라 목왕(穆王)과 함께 잔치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현재 30여 점이 전하며 대부분 조선후기에 그려진 병풍 그림이다(박본수 2020, 139).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생명의 위 기가 닥쳤기에 영원한 생명력의 화신인 서왕모가 조선후기에 더욱 부각되었다(김정은 2016, 68).
장수는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염원이었으므로 장생을 상징하는 「요지연도」는 민간뿐 아 니라 왕실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도판 4>는 1800년(정조 24)에 왕세자(순조) 책봉을 맞이하여 선전관청(宣傳官廳) 관원들이 발의하여 제작되었고 정조 사후인 1802년에 완성 되었다. 이 병풍 그림은 순조와 순원왕후의 혼례 장소인 창덕궁 대조전에 설치되었고, 이 후 순조의 침전인 대조전에 배치되었다(이유정 2024). 따라서 순조는 「요지연도」의 춤 그 림을 지속적으로 향유한 셈이다.

도판 4
「요지연도」(Painting of Yogi Banquet) 부분. 1802.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502000000.do?sch M=view&searchId=search&relicId=66179.
<도판 4>에서 상석인 북벽 에 서왕모가, 그 왼편에 주목 왕이 자리한다. 서왕모와 주 목왕의 잔치상에 각각 장생 불사의 상징인 선도(반도)가 놓여있다. 서왕모와 주목왕 을 관객으로 두고, 중앙 마당 에서 선녀 두 명이 서로 마주 하여 춤추는 모습이다. 춤추 는 선녀의 양옆에 선녀로 구 성된 연주단이 배치된다. 춤 추는 공간은 신화적 공간인 ‘요지’의 ‘반도원’이다. <도판 4>의 하단에는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상징인 신선의 복숭아가 열려있어, 신선의 공간임을 알려준다. 상서로운 공간임을 반영하듯 춤추는 선녀의 앞에는 두 봉황이 함께 춤추는 장면이 이채롭게 그려졌다. 한 쌍의 봉황은 혼인한 부부의 행복을 상징하는 동물이므로, 순조와 순원왕후의 혼례에 적합한 소재였다(이유정 2024, 185).
춤에서 서왕모가 신선의 복숭아를 올리는 모티프는 익숙했다. 서왕모로 분한 왕모가 선 도를 올리는 구성의 헌선도(獻仙桃)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궁중과 지방에서 인기 리에 공연된 정재였고, 혜경궁홍씨의 회갑잔치 때에도 장수를 기원하며 첫 번째로 공연된 종목이었다(조경아 2009, 129). <도판 4>에서는 서왕모의 요지연이라는 신화 속 이야기를 그렸기 때문에 춤도 정재의 형태로 그리지 않고 신화적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도교 신화 속 존재인 서왕모와 신선의 복숭아 모티브는 성리학이 공고화된 조선후기 왕실에서도 여 전히 파급력이 있었다.
2) 「감로탱(甘露幀)」의 춤
불교 신화 속 이야기를 담은 「감로탱」에도 춤이 담겼다. 「감로탱」은 조선시대 영혼을 천도하는 불교의식에 쓰인 의식용 불교 그림으로, 상단에는 일곱 여래 등 영혼을 구제하는 신적인 존재들이, 중단에는 법회를 주재하는 승려들이, 하단에는 인생의 고통과 죽음에 직 면한 다양한 현실 상황들이 묘사되었다(강우방, 김승희 1995, 9).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감로탱」은 1580년 작품이며 1936년까지 그려진 68점 정도가 남아있다(홍선표 2010, 74).
「감로탱」의 중단에 그려진 의식에서 는 승려들이 춤추는 불교 의식춤이 등장 한다. 경국사 소장본 <도판 5>처럼 큰 법고를 치면서 춤추는 법고춤, 바라를 양손에 들고 춤추는 바라춤, 왼손에는 꽹가리가 달린 광쇠를 들고 오른손에는 채를 들고 춤추는 광쇠춤이 「감로탱」에 그려졌다.
「감로탱」의 여러 소장본에서 법고춤, 바라춤, 광쇠춤(나비춤)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바라춤은 봉은사 소장 「감로탱」(1892)처럼 두 승려가 춤추는 모습으로 그려지 기도 한다. 특히 광쇠춤을 추는 승려의 복식은 나비춤과 유사한데, 현재 나비춤이 연꽃을 들고 춤추는 것과 달리 조선시대 「감로탱」 그림에서는 광쇠를 들고 춤추었다는 점이 차별 점이다. 이는 조선후기 불교 천도재에서의 나비춤을 출 때 꽹가리의 형태인 광쇠를 치면서 춤췄던 당시 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나비춤에 지금과 다른 춤 도구를 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감로탱」의 기록적 의미가 있다. 즉, 불교춤에서는 중생이 무지에서 깨 어나도록 소리가 나는 악기인 광쇠, 바라, 법고 등 다양한 음색과 음고의 악기를 치면서 춤을 추었다.
중생의 현실 생활의 모습이 담긴 「감로탱」 하단에는 다양한 공연이 담겼다. 특히 조선후 기 예인들의 연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연희사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연희 종목은 줄 타기, 솟대타기, 쌍줄백이, 땅재주, 방울쳐올리기 등이다(전경욱 2010, 205-206).
연희뿐만 아니라 「감로탱」 하단에는 다양한 춤도 등장한다. <도판 6>의 1692년 안성 청룡사 소장본에서는 사당패 여성이 앉아서 춤추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 옆에서 사당패의 두 광대가 한껏 허리를 젖히면서 재주 넘기를 하고 있다. <도판 7>의 1786년 통도사 소장 본 「감로탱」은 사무신녀(師巫神女)라 표기된 무당이 양손에 지전을 들고 추는 지전춤이 등장한다. 1868년 남양주 흥국사 소장본인 <도판 8>에서는 사당패 여성 둘이 서로 등을 맞대고 맨손으로 춤추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그림에서 눈여겨볼 동작은 두 춤꾼의 손목 춤사위이다. 사당패 춤꾼이 두 팔을 올려 춤추고 있는데, 손목을 자세히 보면 힘을 풀어 손이 툭하고 떨어진 형태로 그려졌다. 1887년 서울 경국사 소장본인 <도판 9>는 사당패 두 여성이 서로 마주하는 구성으로, 손에 수건을 들고 춤추는 수건춤의 형태이다. 여성의 주변에는 광대 네 명이 다리와 팔을 치켜든 채 흥겹게 소고춤을 추고 있다.
「감로탱」에 소개된 춤 주체와 춤 종목은 다채로웠다. 첫째, 승려가 춤추는 법고춤, 바라 춤, 광쇠춤(나비춤)이다. 둘째, 광대패 여성이 춤추는 앉아 추는 춤, 두 여성의 맨손춤, 두 여성의 수건춤이 존재했다. 셋째, 광대패 네 남성의 소고춤이 그려졌다. 넷째, 여성 무당인 사무신녀(師巫神女)가 추는 지전춤도 등장했다. 이처럼 「감로탱」은 불교의 신화적 공간을 표현한 상상 속 그림이지만, 불화를 그린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하던 춤을 그렸을 터이므로 조선후기의 불교 의식춤과 광대의 다양한 춤, 무속 춤까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춤 문화사 적 의미를 지닌다.
Ⅲ. 풍속 공간의 춤 그림
조선시대의 풍속 그림은 관념 속의 인물과 상상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 이 친근하게 그려졌다(고려대학교박물관 2018, 228). 풍속 공간의 춤 그림 중에서 누가 주인공인가를 알 수 없는 작품이 대상이다. 이 경우에 누가 춤의 주요 관객인가는 알 수 없는 반면에 누구나 풍속화 그림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보편성을 얻는다.
1. 풍속 그림의 춤
1)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의 춤
「태평성시도」는 제목 그대로 도성 안의 태평한 모습을 담아낸 그림이다. 특히 조선시대 다양한 상업활동과 활달한 서민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태평성시 도」는 8폭 병풍 그림인데, 춤추는 모습이 세 곳에서 보인다.
첫 번째는 기녀의 검무이다. <도판 10-1>은 검무의 전형적인 전투 복식인 쾌자를 입은 두 기녀가 양손에 장검을 들고 서로 마주하여 춤추는 모습이다. 화면으로 춤꾼 왼편에는 주빈 남성 한 명이 앉았고, 그 곁에 춤 관객이 자리했다. 화면 오른편에는 서서 검무를 구경하는 관객들도 있다. 춤 공간은 지붕과 네 기둥이 있는 야외무대인데, 돌을 둥글게 쌓 아 올린 기단 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위에 춤 공간을 높임 무대로 만들었다. 검무의 반주단 은 무대 아래에 배치된 남성 악사 7명이며, 삼현육각 편성에 생황이 추가되었다. 두 번째 <도판 10-2>는 무동춤이다. 책을 파는 상점 벽 뒤에서 총각 머리의 무동 두 명이 왼쪽 다리를 굽혀 들고 두 팔은 편 채 대무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춤을 쳐다보는 구경꾼이 그려 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놀이하듯 춤추는 모습으로 유추된다. 세 번째 <도판 10-3>은 과거 급제자를 위한 삼일유가의 광대춤이다. 앞의 어린 두 광대는 붉은 옷을 입고 흰 한삼을 끼고 팔을 들어 춤추고, 그 뒤에는 『경도잡지(京都雜誌)』에 소개되었듯 “비단 옷에 누런 초립을 쓰고 채화와 공작 깃털을 꽂고 현란하게 춤추며 재담을 늘어놓는”(조경아 2021, 146) 두 광대춤이 뒤따랐다.

도판 10-1
검무
「태평성시도」(Painting of the City of Supreme Peace) 부분.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502000000.do?schM=view&searchId=search&relicId=1349.

도판 10-2
무동춤
「태평성시도」(Painting of the City of Supreme Peace) 부분.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502000000.do?schM=view&searchId=search&relicId=1349.

도판 10-3
삼일유가의 광대춤
「태평성시도」(Painting of the City of Supreme Peace) 부분.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502000000.do?schM=view&searchId=search&relicId=1349.
이수미(2004)에 따르면, 풍성한 상업활동을 묘사한 「태평성시도」는 조선후기 국왕을 비 롯한 지식인들이 도시에 관해 갖고 있던 관념과 조선시대가 지향했던 ‘태평성대’라는 이상 향이 반영되었다(56).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태평성시도」에 춤추는 장면이 세 차례에 걸 쳐 그려진 것은 태평한 시절을 춤으로 나타내려는 조선시대의 표현 방식이었다. 해주의 양로연을 그린 「해영연로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태평한 시대의 멋진 일(太平勝 事)”(김미영, 박정혜 2012, 277)로 인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선 사람들에게 춤을 언제 추는가를 물으면, 시절이 태평하여 마음이 편안하고 기쁠 때 춤이 절로 나온다고 대답했을 법하다. 춤추는 그림을 그린 이유는 태평한 시대라는 결과를 보여주려는 의도이자, 미래의 태평을 염원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2) 노동 그림의 춤: 「세시풍속도(歲時風俗圖)」ㆍ「풍속도」
조선시대 노동의 현장에서도 춤은 빠지지 않았다. <도판 11>은 동아대 석당박물관 소장 「세시풍속도」 10폭 중 5폭이다. 화면 상단에 농사 일을 하는 농부가 있고, 하단에 장구와 태평소 소리에 맞추어 네 농부가 소고춤을 춘다. 소고춤은 노동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노동 의 춤이자, 들녘의 춤이었다. 전통시대에 삶의 터전이었던 논은 춤의 무대가 되었고, 농사 꾼은 소고 춤꾼이 되었다. 농사일을 하면서 춤을 추어 흥을 돋우었던 농촌의 춤 문화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판 12>는 건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풍속도」 8폭 중 7폭으로, 가을 추수를 마친 뒤 에 타작하는 마당에서 춤추는 장면이다. 그림 상단에 곡식의 주인인 양반이 감시하는 듯 앉아있고, 곁에는 시중을 드는 2인이 있으며, 바닥에는 술과 안주가 준비되었다. 그림 중단 에는 농부 네 명이 마당에서 힘차게 타작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림 하단에는 소고를 신나 게 치는 광대의 반주에 맞추어 부채를 잡고 태극 모양으로 양팔을 들어올린 채 춤추는 여 성 춤꾼이 보인다. 춤꾼이 기녀인지, 광대패의 일원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흥을 돋우어 노 동의 힘듦을 상쇄시키고, 그로 인해 노동 생산성을 고취시킨 춤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두 그림은 조선시대 농경 문화 속에서 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소고는 농사와 가까운 춤 도구였던 듯하다. 농부들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농사일의 고단함을 달래고 흥을 돋우기 위해 소고를 치며 춤추었다. 또한 타작의 현장에서 소고의 반주에 맞추어 1인이 부채춤을 추었다는 사실은 조금 이채로운 장면이다. 조선후기 노동 현장의 춤에는 집단춤과 개인춤이 양립했다.
3) 개인의 일생을 그린 그림의 춤: 「평생도(平生圖)」ㆍ「회혼례도(回婚禮圖)」
일생을 몇 장면으로 압축하면 어떤 그림이 담길까? 「평생도」는 조선 사대부 양반가에서 추구했던 이상적인 일생을 병풍에 그린 풍속화로, 조선 사람들은 부귀영화와 백년해로의 욕망을 「평생도」로 시각화했다(홍선표 2018, 162-163). 평생도에는 개인 의례와 관직생활 이 담겼는데, 개인 의례 장면은 돌잔치, 혼인식, 회혼례 등이고 글공부, 회갑, 회방이 포함 되기도 한다. 관직생활은 장원급제(삼일유가), 최초의 벼슬길, 관찰사부임, 판서행차, 정승 행차 등이다(최성희 2001, 7-11).
일생이 집약된 「평생도」에서 춤 장면은 빠 질 수 없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10 폭 병풍 「평생도」에는 특별한 춤 그림이 남 아있다. 그림의 주인공은 알 수 없으나, 제1 폭에 “공이 10세에서 39세에 이르기까지의 이력도(公自十歲三十九至履歷圖)”라는 문구 가 있으므로, 주인공의 30대까지 생애 그림 이다. <도판 13>은 10폭에 그려진 그림으로 관직생활 중 잔치하는 장면이다. 잔치에 초 대된 5명이 악사들의 반주에 맞추어 팔을 치 켜들고 춤추는 광경이 그려졌다. 조선시대 관아의 양로연에서는 초대된 노인들에게 춤 을 추도록 권유하기도 했고 수령도 함께 춤 추었던 문화가 있었는데(조경 아 2020, 186), 이 그림의 주 인공도 양로 잔치에서 노인들 에게 춤추도록 권했거나, 자 신도 관료로서 함께 춤추었던 장면을 생애의 중요한 순간으 로 기억하여 그린 듯하다.

도판 13
「평생도」(Major Events in the Life a Certain Government Official) 10폭 부분.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결혼 60주년을 기념한 의 례인 회혼례(回婚禮)는 별도 의 그림으로도 남아있다. 국 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회혼 례도」 5폭에 춤이 그려졌다. 그림 속에서 공연 공간은 위로 차일을 높게 치고,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옆으로 병풍을 세워 마련되었다. 잔치상 앞의 중앙에는 두 기녀가 서로 마주하여 춤추는 모습이 그려졌다. 삼현육각 편성으로 군복을 입은 세악수(細樂手)가 춤의 반주를 맡았다. 아마도 회혼일에 왕으로부터 음악과 비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박정혜 2022, 205). 회혼례나 회방을 맞 은 개인에게 가무악 공연단을 보내주는 사악(賜樂)제도가 있었는데(조경아 2016, 92-93), 조선후기 법전인 『속대전(續大典)』에 사악의 춤꾼으로는 무동이나 처용무 등 남성 춤꾼만 보낸다고 기록되었으나 실제는 기녀도 사악으로 포함되었다. 관아 소속의 악공인 세악수 가 반주를 맡고, 역시 관아 소속의 두 기녀가 춤을 추었던 것으로 보아 사악으로 내려진 음악과 춤으로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개인의 일생에 중요한 의례였던 회혼례의 춤 모습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림으로서 가치가 있다.

도판 14
기녀 춤. 「회혼례도」(Ceremonial Scene of The 60th Wedding Anniversary) 5폭 부분. 기녀 춤.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502000000.do?s chM=view&searchId=search&relicId=1492.
4) 풍류 그림의 춤: 「풍속도(風俗圖)」ㆍ『기산풍속도(箕山風俗圖)』ㆍ『혜원전신첩』ㆍ「무동(舞童)」
조선후기 풍속도에는 다양한 춤과 놀이가 등장 한다. <도판 15>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풍 속도」이다. 이 그림은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소장 된 김홍도의 「사계풍속도병(四季風俗圖屛)」(국립 국악원 2004, 148)과 춤추는 모습이 매우 유사하 나, 의상의 채색된 빛깔이 더 선명하다. <도판 15>에서 화면 중앙에 사당패 두 여성이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부채춤을, 왼쪽 화면에 사당패의 두 남성이 소고춤을 추고 있다. 길에 둘러선 광대패 춤의 관객들은 아이를 업은 아낙부터 양반과 도 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흥미로운 듯 춤에 눈 길을 보낸다. 이 그림의 광경은 조선판 길거리 버 스킹 공연의 현장이었다.

도판 15
「풍속도」(A Genre Painting) 1폭. 사당연희.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 nts/M0502000000.do?schM=view&searchI d=search&relicId=107221.
거리는 아니지만, 자연 속에서 춤추며 노닐었 던 풍경은 간송미술관 소장의 신윤복(申潤福, 1758~?) 『혜원전신첩』중 「납량만흥(納凉漫興)」 에서도 확인된다. ‘납량만흥’이라는 제목을 풀이 하면 ‘여름에 서늘한 곳에서 절로 일어나는 흥취’ 라 하겠다. <도판 16>은 제목처럼 여름날에 시원 한 자연을 찾아 기녀와 선비가 짝을 이루어 춤추 며 흥취를 즐기는 광경이다. 춤의 관객은 화면 왼 편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두 선비이다. 여름날의 놀이판에 장구, 피리2, 해금 악사를 대동했다. 이 그림에서 춤추는 공간은 특별한데, 여름 더위를 피해 바위에 둘러싸인 자연이었다. 커다란 바위의 품에서 선비와 기녀는 양팔을 벌리고 춤추고 있다. 2인무의 대형은 서로 마주하여 춤추는 상대이무(相對而舞)가 대부분이며, 간 혹 서로 등지는 상배이무(相背而舞)나 서로 나란히 서는 제행이무(齊行而舞)의 형태로 그 려지는데 여기서는 마주하지도 등지지도 않은 어정쩡한 방향이다. 선비와 기녀가 살짝 내 외하는 듯하면서도 어우러져 춤추는 느낌이 드는 방향으로 서서 두 팔을 벌려 춤추는 모습 이다.
신윤복과 같은 시기를 살았던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은 『경도잡지(京都雜誌)』 권1 풍속 ‘소리와 기예(聲伎)’ 항목에서 남녀가 함께 추는 춤을 “춤은 상대(相對)하여 추는데, 남자는 소매를 밀어젖히고 여자는 손을 뒤집는다(舞以對舞, 男排袖, 女翻手)”라고 소개했 다(1792, 5b3). 유득공은 당시 춤추는 풍속으로 남자는 주로 팔을 이용한 너른 소매춤을 추고, 여자는 손을 뒤집고 젖히는 손춤을 주로 춘다고 파악한 듯하다. <도판 16>에서도 선비는 소매춤을 추는 모습으로, 기녀는 손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 그림이 주목 되는 이유는 자연에서 흥취를 즐기며 기녀와 선비가 함께 춤추는 문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양반은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공고하게 무장되어 기녀와 춤추지 않 았을 것 같지만, 실제는 일상에서 춤을 즐기며 살았던 풍경이 존재했음이 반영된 그림이다.
조선후기 풍속을 그린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은 19세기 말에 활동한 화가로서 외국 인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화가였다(정병모 2006, 985). 그는 부산, 원산, 제물포 등 개항장 에서 서양인을 상대로 수출 풍속화를 제작했고, 서양인의 이국취향과 호기심을 만족시키 는 민속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을 그렸다(김수영 2009, 87-88).
김준근은 『기산풍속도첩』에서 한 장면에 한 종목의 춤을 그렸는데, 화폭에 담은 춤은 무고(도판 17ㆍ18), 검무(도판 20), 무동춤(도판 22), 탈춤(도판 23), 무당춤(도판 26), 수륙 재의 법고춤과 바라춤, 사당패의 춤 등이었다. 김준근의 풍속화에서 춤이 적지 않은 비중 을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준근의 그림이 서양인에게 팔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우리 풍속을 소개할 때 춤은 매력적인 소재였던 듯하다.
<도판 17>과 <도판 18>은 ‘무수츔’ 즉 ‘무고’를 그린 그림이다. 미국(Smithsonian Institution) 소장본인 <도판 17>은 단순한 구도로 두 기녀가 한 개의 북을 치며 춤추는 장면이었는데, 덴마크(Nationalmuseet) 소장본인 <도판 18>에서는 춤추는 기녀도 셋으로 늘었고, 박을 치는 기녀와 삼현육각 편성의 악사도 함께 그려졌다. 조선후기 궁중에서 무 고는 가장 인기리에 공연되던 정재였는데(조경아 2009, 174-176), 김준근이 두 판형의 무 고를 그릴 만큼 19세기 말에 민간에서도 무고는 ‘무수춤’으로 널리 향유되었던 듯하다.

도판 17
김준근. 「무수츔추고」(Dancers performing drum dance). 19세기. Smithsonian Institution, 미국. https://www.si.edu/object/archives/com ponents/sova-naa-ms211195-ref88.
검무는 민간에서도 널리 유통되었다. <도판 19>는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신윤복의 『혜원 전신첩』 중 「쌍검대무(雙劍對舞)」인데, 서늘한 치맛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두 기녀는 쌍검 을 들고 재빠른 춤사위를 펼쳐내는 모습이다. 두 기녀는 서로 상대하여 칼을 겨누었으며, 궁중 복식처럼 전립과 전복(戰服)을 잘 갖춘 차림새였다.
19세기 말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도판 20> 김준근의 「풍류검무(風流劍舞)」에서도 역시 전립과 전복을 갖춘 검무의 형태가 그려졌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도판 19>와 달리 <도판 20>에서는 단검을 사용한 것이다. 검무에서 단검을 사용한 그림은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에 소장된 『기산풍속도첩』 의 「기생 검무하는 모양」의 채색 그림에서도 마찬 가지였다. 기산풍속도가 함부르크 민족박물관에 들어온 시기를 1894년으로 잡으므로(조흥 윤 2004, 6; 122-123) 늦어도 이 시기에 단검을 쓰는 검무가 유행된 듯하다. 궁중에서는 1902년 진연까지 장검을 쓰는 검무(검기무)만 있었으나, 민간에서는 19세기 말부터 단검 을 쓰는 검무가 유행했음을 기산의 검무 그림으로 알 수 있다. 단검을 쓰는 검무는 일제강 점기 이전에 이미 상용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20
김준근. 「풍류검무」(Enjoying the coolness of sword dance).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 0502000000.do?schM=view&searchId=search&relicId=36551267.
검무는 조선후기 궁중과 지방관아에서도 인기리에 공연된 정재종목이었다(조경아 2009, 234-235). 또한 검무는 광대들도 공연하던 종목이었는데, 신재효본 「변강쇠가」에서 “검무 추난 아이놈이 양손에 칼을 들고 연풍대 좌우사위 번듯번듯 드러메고”라고 한 내용이 그 증표이다(전경욱 2010, 195). 즉, 검무는 조선 말에 장검과 단검이 양립했고, 궁중이나 관 아의 기녀뿐 아니라 광대들도 공연하던 인기 종목이었다.
무동의 춤도 그림에 등장한다. 풍속화에서 가장 친숙한 춤 그림 중의 하나는 김홍도(金 弘道, 1745-1806)가 그린 「무동」일 것이다. 그림 속 무동은 왼발로 땅을 디뎌 오른발을 높이 들었고, 왼팔은 머리 위로 오른팔은 옆으로 펼쳐 든 모습이다. 힘껏 도약하는 무동의 춤사위에 따라 긴 소매가 나풀거린다. 오주석(1999)은 소년의 출렁이는 옷자락을 천연덕스 럽게 척척 그어댄 「무동」의 선은 “우리 옛 그림에서만 볼 수 있는 멋드러진 선”이라고 치 켜세운다(180). <도판 21> 무동의 주위에는 빙 둘러선 삼현육각의 반주 악공이 자리했다. 삼현육각 편성의 악공들은 그림 속에서 주로 일렬로 배치되는데 반해, 이 그림에서는 삼현 육각 악대가 반원으로 배치되어 춤추는 무대 공간의 율동감을 더하고 있다. 무동의 소속이 관아 혹은 광대패인가, 누구를 관객으로 하는 춤인가는 모른다. 그렇다 할지라도 조선후기 궁중에서 정재를 춤추었던 무동뿐 아니라, 풍속 공간에서 활동한 무동이 동시대에 존재했 음을 「무동」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판 21
김홍도. 「무동」(A Boy Dancer).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https://www.museum.go.kr/MUSEUM/co ntents/M0502000000.do?schM=view&se archId=search&relicId=553.
풍속 공간에서 활동한 무동의 존재는 김준근이 그린 「석도무약(釋徒舞躍)」(도판 22)에 서도 확인된다. ‘석도무약’이라는 제목을 풀이하면 ‘중의 무리가 춤추며 도약한다’ 이다. 함부르크 박물관 소장본에 이와 유사한 그림은 “굿중패 놀음 놀고”라는 제목이 달렸다. 시주를 청하는 중이 꽹가리를 치며 돌아다니면 ‘굿중’이라 했는데, 이들이 유랑 연예인 집 단으로 발전하여 굿중패가 되었다(조흥윤 2004, 102). <도판 22>에서 성인 남자의 어깨 위에 올라 춤추는 무동이 보인다. 이런 무동의 어깨타기 춤은 지금까지도 민속춤으로 이어진다. 무동은 단독으로 춤추기도 하고 어른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춤추기 도 했다.

도판 22
김준근. 「석도무약」(The monk's group dances and leaps) 무동춤.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502000000.do ?schM=view&searchId=search&relicId=36551267.
그 밖에 함부르크민족박물관에 소장된 <도판 23>처럼 말뚝이ㆍ양반ㆍ노장ㆍ각시 등이 등장하는 탈춤도 김준근의 화첩에 그려졌다.
5) 굿 그림의 춤: 『무당내력(巫黨來歷)』․「무녀신무(巫女神舞)」․「무녀신축(巫女神祝)」
무속을 그려낸 풍속도에도 춤이 존재했다. 신윤복의 「무녀신무」, 김준근의 「무녀신축」과 서울대규장각 소장본인 『무당내력』 등이다. 특히 『무당내력』은 무당춤을 한 면에 하나씩 채색화로 그린 책인데, 무당춤 연구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술연대는 1825년 혹은 1885년으로 추정되며, 난곡(蘭谷)이라는 호를 쓰는 사람이 서울굿의 거리를 개별 그림으 로 설명했다(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3).
간송미술관 소장의 <도판 24>에서 두 명의 악사는 박수인 남성이지만 춤을 추는 무당과 복을 비는 무당춤의 관객은 여성이었다. 이와 달리 <도판 26>에서 세 명의 악사는 모두 여성 무당이었다. <도판 24ㆍ25ㆍ26>에서 춤추는 무당은 손에 부채를 들었고, <도판 25> 와 <도판 26>에는 방울도 함께 들었다. <도판 24>는 옷자락 속에 방울이 있을 수 있으나,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모두 소개하지 못하지만 『무당내력』에는 굿 종류에 따 라 무당이 다른 의물을 들고 춤추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무당춤이 다수 그려진 이유는 조선은 유교 사회이지만 일상의 삶은 무속과 밀접했기 때문이다.

도판 26
김준근. 「무녀신축」(The shaman bestows blessings). 무당춤.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https://www.museum.go.kr/MUSEUM/con tents/M0502000000.do?schM=view&sear chId=search&relicId=36551267.
Ⅳ.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의 춤 그림에서 읽은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겠다.
첫째,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 그림 속 춤 공연자는 누구인가. 도교적 존재인 선녀, 불교 적 존재인 스님, 무속적 존재인 무당, 전문 공연자인 기녀와 사당패의 남녀를 비롯하여, 일상에서 춤을 즐기는 양반, 일하는 농부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웠다. 이는 조선사회에서 종 교와 신분을 넘어서서 실제로 춤을 즐기고 향유했던 층이 폭넓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 춤 그림 속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였나. 춤이 그려진 때는 주로 잔치였다. 요지의 잔치, 곽분양의 잔치, 변사또 생일잔치, 결혼 60주년 잔치 등이었다. 기쁨의 자리인 잔치에 춤이 있어야 잔치의 흥을 돋울 수 있다고 여겼기에 춤은 잔치 그림의 중앙에 그려졌다. 또한 노동의 현장에서 춤추는 농부나 사당패의 춤이 등장한 것도 기쁨의 흥취를 돋우어 노동의 힘듦을 상쇄시키고 생산성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셋째,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의 춤 무대는 어디였나. 그림 속에서 춤 무대는 주로 야외에 돗자리를 깔아 마련되었다. 1인무인 경우에 작은 원형이나 네모 돗자리가 마련되었고, 2인 무인 경우에도 돗자리로 무대 공간이 마련되는 경우가 흔했다. 들판이나 길가에서도 춤판 이 벌어졌으며, 기녀와 양반이 암석이 가득한 자연을 무대로 삼아 더위를 피해 춤을 즐기 는 모습도 이채로웠다.
넷째,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의 그림에는 어떤 춤이 등장했나. 기녀가 춤추는 검무, 무고 (무슈)와 승무(법고춤) 장면이 그려졌다. 승무에서 검은 장삼을 입고 추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이 추는 법고춤, 바라춤, 나비춤(광쇠춤)을 그린 그림에서는 현재와 달리 나비 춤을 출 때 광쇠를 들고 춤추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사당패가 추는 소고춤, 수건춤, 맨손춤, 부채춤, 무동춤도 그려졌다. 맨손춤을 추면서 손목에 힘을 툭 풀어 손을 떨구는 춤사위는 민속춤에 자주 나타나는 손사위인데 조선후기 그림에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감로탱」은 조선후기 불교 의식춤과 광대의 다양한 춤, 무속 춤까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춤 문화사적 의미를 지닌다.
다섯째, 어떻게 춤추는 모습으로 그려졌나. 춤 구성은 1인무와 2인무, 3인 이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2인이 마주하거나 등지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때로는 앉아서 춤추는 모습도 표현되었다. 중국에서 유래한 전설이나 이야기인 요지연과 곽분양 잔치에서는 중국풍으로 춤추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2인 이상의 춤일 경우에는 같은 신분의 춤꾼으로 구성되는데, 혜원의 그림에서 기녀와 양반이 어우러져서 춤추는 모습이 그려진 것이 특별하다.
여섯째, 왜 춤이 담겨있는 그림을 그렸을까. 조선시대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의 그림에 춤이 그려진 이유는 잔치에 춤이 빠질 수 없었던 당시 문화의 반영이자, 개인적으로 인생의 즐거움과 흥겨움을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표현하려면 춤만 한 것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으로 태평한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춤추는 모습을 그렸다. 「태평성시 도」의 주제인 ‘태평성대’는 조선사회가 지향하는 지점인 동시에 조선시대 춤의 중요한 주제였 다. 이처럼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에 풍성하게 그려진 춤 그림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춤을 즐기고 살았던 것의 반영이자, 춤출만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결과였다.
이 연구는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의 춤 그림을 최대한 집적하여, 그림이 이야기하는 조 선의 춤 풍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했다. 다만, 이 글은 숲을 보는 성격이어서 나무와 잎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에 이 연구에서 소개된 그림을 토대로 깊이있는 연구로 진전되길 기대한다.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의 그림이 보여주는 조선 춤 문화는 신분과 종 교와 나이와 성별을 떠나 매우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선 사람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조선 민간의 풍성한 춤 문화를 밝히는 데 조금이라도 이 연구 가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그림을 도판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상상 공간과 풍속 공간의 춤 그림 목록(List of Dance Paintings in Imagined and folk spaces)
| 공간 | 연번 | 그림명/ 화가 | 소장처 | 연도 | 춤 종목 | 춤꾼 | 춤판 |
|---|---|---|---|---|---|---|---|
| 상상 공간의 춤 그림 |
1 | 구운몽도 | 계명대박물관 | 19세기 | 검무 | 심요연 | 낙유원 잔치 |
| 2 | 춘향도 | 경희대박물관 | 조선후기 | 승무(법고춤) | 기녀 2인 | 변사또 잔치 | |
| 3 | 곽분양행락도 | 국립중앙박물관 | 19세기 | 독무 | 기녀 1인 | 곽자의 잔치 | |
| 4 | 요지연도 | 국립중앙박물관 | 1802 | 2인무 | 선녀 2인 | 반도원 잔치 | |
| 5 | 감로탱 | 서울 경국사 | 1887 | 법고춤, 바라춤, 나비춤(광쇠춤) | 스님 3인 | 천도재 | |
| 6 | 감로탱 | 안성 청룡사 | 1692 | 앉아서 추는 춤 | 여 사당패 1인 | - | |
| 7 | 감로탱 | 통도사 | 1786 | 지전춤 | 무당 1인 | - | |
| 8 | 감로탱 | 남양주 흥국사 | 1868 | 맨손춤 | 여 사당패 2인 | - | |
| 9 | 감로탱 | 서울 경국사 | 1887 | 수건춤 맨손춤 |
남 사당패 4인 여 사당패 2인 |
- | |
| 풍속 공간의 춤 그림 |
10 | 태평성시도 | 국립중앙박물관 | 18세기 | 검무, 무동춤, 광대춤 | 기녀 2인 무동 2인 사당패 4인 |
야외무대 길가 길가 |
| 11 | 세시풍속도 | 동아대박물관 | 19세기 | 소고춤 | 농부 4인 | 들판 | |
| 12 | 풍속도 | 건국대박물관 | 조선후기 | 부채춤 | 기녀(사당패?) 1인 | 타작 마당 | |
| 13 | 평생도 | 서울역사박물관 | 19-20세기 | 양반춤 | 양반 5인 | 양로 잔치(?) | |
| 14 | 회혼례도 | 국립중앙박물관 | 18세기 | 기녀춤 | 기녀 2인 | 회혼 잔치 | |
| 15 | 풍속도 | 국립중앙박물관 | 19세기 | 소고춤, 부채춤 | 사당패 4인 | 길가 | |
| 16 | 납량만흥/신윤복 | 간송미술관 | 19세기 초 | 기녀와 선비 춤 | 기녀, 선비 | 자연 | |
| 17 | 무수츔추고/ 김준근 |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 19세기 | 무고 | 기녀 2인 | - | |
| 18 | 기생무수츔추고/ 김준근 | 덴마크 국립박물관 | 조선후기 | 무고 | 기녀 3인 | - | |
| 19 | 쌍검대무/신윤복 | 간송미술관 | 18세기 | 검무 | 기녀 2인 | 야외 | |
| 20 | 풍류검무/김준근 | 국립중앙박물관 | 19세기 | 검무 | 기녀 2인 | - | |
| 21 | 무동/김홍도 | 국립중앙박물관 | 조선후기 | 무동춤 | 무동 1인 | - | |
| 22 | 석도무약/김준근 | 국립중앙박물관 | 19세기 | 무동 어깨타기, 광대춤 | 무동 1인, 사당패 4인 | - | |
| 23 | 팔탈판/김준근 | 함부르크민족박 물관 | 19세기 | 탈춤 | 광대패 7인 | - | |
| 24 | 무녀신무/신윤복 | 간송미술관 | 조선후기 | 무당춤 | 무당 1인 | 굿판 | |
| 25 | 무당내력/난곡 | 서울대규장각 | 조선후기 | 무당춤 | 무당 1인 | - | |
| 26 | 무녀신축/김준근 | 국립중앙박물관 | 19세기 | 무당춤 | 무당 1인 | 굿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