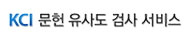Ⅰ. 서 론
본 연구는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한 창작 경향으로 컨템퍼러리댄스의 여러 창작 형태의 하나인 이머시브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윌리엄 포사이드의 「헤테로토피 아(Heterotopia)」에 나타난 이머시브 요소에 초점을 맞춰 비평적으로 접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머시브 공연은 1960년대 말 초기 개념의 형성 이래로 성장과 확산을 거듭하였으며 근래에 이르러서는 컨템퍼러리댄스 공연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서유럽과 미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2010년대 들어 여러 무용가에 의해 시도 되고 있으나 국내 무용계에서 이머시브 공연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
이론적 근간을 위해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에 리차드 쉐크너(Richard Schechner)의 환경 적 개념이 초기 이머시브 공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언급하는 한편, 무대와 객석에 차 이를 제거하려는 자크 랑시에르(Jacque Ranciere)의 개념이 이머시브 공연의 본격적인 확 산과 발전에 기여한 바를 조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이머시브 공연 단체인 펀치드 렁크(Punchdrunk)의 작품들과 동시대 춤의 혁신을 이끄는 윌리엄 포사이드(William Forsythe)의 작품들을 다룸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윌리엄 포사이드의 「헤테로토피아」를 통해 동시대 무용창작에서 나타난 이머시브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척한다. 해당 작품의 경우, 전통적인 무 대 공연 연행에서 벗어나 관객과의 소통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공연 형태를 일찍이 실험했 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 하겠다. 포사이드의 「헤테로토피아」에 나타난 이머시브 적 요소에 관해 비평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비평 이론 저서 『무용비평과 감상』(심정민 2020, 63-69)의 “내재적 및 외재적 접근”이라는 논점에 맞춰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내재적 비평은 작품 자체에 집중하여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며, 창작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나 교육, 철학 등 예술 외적인 담론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외재적 접근 또한 중요하게 부각된다.
근래 들어 컨템퍼러리댄스에 이머시브를 활용한 확장적인 창작 형태가 시도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국내 무용계에서는 여전히 그에 관한 탐구적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관계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윌리엄 포사이드의 「헤테로토피아」에 관한 연구의 경 우, 2014년 처음으로 본 연구자의 학술논문 “미셀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구현한 윌 리엄 포사이드의 헤테로토피아”가 발표된 이래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유사한 방식으로 다 뤄져 왔다. 하지만 이머시브적인 접근은 찾아보기 힘든 관계로 1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진척된 형태의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내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관련 논문으로 백영주(2015)의 “이머시브 연극의 경험성과 매체성 연구”, 권용(2017)의 “이머시브 공연의 확장된 의미로서의 공간 연구”, 정새롬(2019)의 “이머시브 연극의 공연미학 연구”, 김지호(2023)의 “이머시브 공연에 나타나는 관객의 체 험”, 신민정(2018)의 “윌리엄 포사이드의 안무 성향에 관한 고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내한 공연 당시 직접 관람과 평론 발표를 바탕으로 관련 저서, 논문, 기사, 영상 등을 통해 다층적으로 접근한다.
본 연구 과정에서는 이머시브 공연의 개념과 전개 그리고 예술적 특성을 다루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이머시브 공연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개념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연극을 중심으로 타 예술 분야에서 ‘이머시브’란 개념에 대한 논의는 상 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무용 분야에서는 이에 관한 이해를 돕는 이론적 논의가 부족하기에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이머시브 공연(immersive performance)은 관객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작품에 참 여하게 하는 공연을 의미하는데, 최근에 관객 참여형이나 관객 몰입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정한 장소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으며, 작품 안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감상하 도록 유도되기도 한다. 1980년대 서유럽에서 시작하여 21세기 전환기에 주도적인 무용 경 향으로 자리 잡은 컨템퍼러리댄스(contemporary dance)는 다양한 창작 연행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중 이머시브적 요소를 통해 창작 표현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례도 있다. 여기서는 컨템퍼러리댄스 공연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은 이머시브 공연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포사이드의 2010년대 작품들과 그중에서 특정 작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유의미한 이머시브 작품을 발표한 국내외 무용가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머시브 무용공연의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전개 상황과 형태 변화를 자연 스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머시브 공연의 예술적 특성에 대한 효과나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데, 무용창 작에 있어 새로운 표현 방법 제시, 행위와 관람의 관점 다각화 가능성, 전통적이고 정형화 된 극장 개념에서의 탈피, 일반 관객과의 소통 창구 다양화, 무용예술에 대한 대중적 수용 력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이머시브 공연에 대한 개념적 이해, 전개 상황, 예술적 특성 등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이끌 수 있으며 차후 연계된 연구에도 근간 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머시브 공연의 개념과 전개
1. ‘이머시브’의 개념과 초기 전개
이머시브 공연(immersive performance)은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 위에 연기, 춤, 노래 등 을 수동적으로 감상하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작품에 참여하게 하는 공연을 의미한다. 여기서 ‘Immerse’는 ‘담그다, 흡수하다, 몰두하다, 몰입하다’와 같은 뜻을 지닌다. 이머시브 공연에서 관객은 행위자와 무대 장치가 만들어 낸 작품 세계의 일원으로 흡수되곤 한다. 그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으며, 작품 안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감상하도록 유도되기도 하는데, 후자의 경우 무대를 이리저리 자유로이 돌아다니며 퍼포 먼스를 감상하면서 자기만의 감상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머시브 공연의 개념은 멀리는 1968년 미국 연극학자 리차드 쉐크너(Richard Schechner) 가 “환경연극을 위한 6가지 공리(6 Axioms for Environmental Theatre)”라는 논고에서 ‘연극 적 사건은 연관된 과정들의 집합이다. 공연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공간은 관객을 위해 사용된 다. 연극적 사건은 완전히 변형되거나 발견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초점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모든 공연 요소는 고유의 언어로 소통된다. 텍스트가 공연의 목표가 될 필요는 없으며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정의한 것에서 출발한다(Richard Schechner 1968, 41-64).
백영주(2015)에 의하면 ‘이머시브(immersive)’라는 용어는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등장한 1980년대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시청각을 중심으로 모든 감각에 정보나 자극을 제공 하는 것’으로 매체적 관점에서 가상의 세계가 마치 내가 위치한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 처럼 느껴지도록 조성된 일련의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111-120). 관객이 실제로 느낀다 는 점에서 실감 극, 관객 참여형, 관객 몰입형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머시브 공연은 관객과 예술 사이에 벽을 허물면서 관찰자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20세기 중엽에 이머시브 초기 작품들은 무대-객석이라는 전통적인 구조를 해체하면서, 관객을 작품 내부로 적극 참여시키는 실험적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의 미술가이자 퍼포먼 스 아티스트인 앨런 카프로(Allan Kaprow)의 「해프닝(Happenings)」이라는 실험적 공연을 통해 관객 참여 중심의 예술을 시도하였으며 플럭서스 무브먼트(Fluxus Movement)는 여러 공연을 통해 미술, 음악, 퍼포먼스의 경계를 넘나들며 관객의 참여와 상황성을 중시했다. 폴란드 연출가 예지 그로토프스키(Jerzy Grotowski)는 「가난한 연극(Poor Theatre)」에서 무대 장치 없이 행위자와 관객 사이의 직접적 교류에 집중하였다. 이렇듯, 초기 작품들은 이머시브 형식의 핵심 요소인 공간, 관객 참여, 비선형 서사, 감각적 몰입을 실험적으로 제시한 선구적 사례로 간주된다. 특히,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해체하면서 관객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극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이머시브 공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머시브 공연의 확산과 주요한 특질
이머시브 공연은 위와 같은 초기 시도를 바탕으로 1990년대 말부터는 전통적 무대의 해체, 관객의 이동과 선택, 몰입적 공간 연출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조세핀 마콘 (Josephine Machon 2013)이나 스티브 딕슨(Steve Dixon 2007)은 이머시브 공연과 관련한 논의를 다루는 데 있어 여러 단체를 언급하고 있다. 왈츠 인 매트릭스(Waltz In Matrix)의 「Stalker Theatre Company」(1997)는 관객이 공연 공간을 물리적으로 직접 걸어 다니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무대 위가 아니라 360도 둘러싸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진행되 었기 때문에 VR/AR 기반 이머시브 작품의 원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와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의 「Scenario」(1997)는 현대무용과 패션 그리고 인스톨레이션의 융복합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행위자와 관객 사이의 거리를 허물면 서 관객을 퍼포먼스의 일부로 끌어들였다. 블라스트 씨어리(Blast Theory)의 「Desert Rain」 (1999)에서는 현실과 가상 시뮬레이션의 경계를 흐리며 이머시브의 개념을 확장하였는데,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초기 VR 기반 퍼포먼스 사례로 꼽힌다.
펀치드렁크의 창립자인 페릭스 바렛(Felix Barrett)은 1990년대 말 대학 재학 당시 기숙 사 방에 관객을 잠입시키는 퍼포먼스를 시도했는데 방 안에서 단서를 찾아 서사를 만들어 가는 경험을 이끌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이후 「슬립 노 모어(Sleep No More)」에도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펀치드렁크의 초기작 중에서 「The House of Oedipus」 (2000)는 연극, 인스톨레이션, 공간 등이 융해된 작품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고대 그리스 비극을 기반으로 한 여러 공간을 돌아다니며 이야기 조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의 이머시브 작품들은 디지털 미디어, 인스톨레이션, 무 용, 사운드, 건축적 공간, 실시간 익터렉션 등을 결합하여 전통적 무대의 해체, 관객의 이동 과 선택, 몰입적 공간 연출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머시브 공연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확산에 기여한 단체로 펀치드렁크, 써드 레일 프로젝트(Third Rail Projects), 청소년 인터랙티 브 씨어터 교육(Teen Interactive Theater Education), 이머시브 씨어터 바이블(The Immersive Theater Bible), 랫츠 씨어터(RATS Theatre), 미드나잇 비지트(A Midnight Visit), 데이비드 번과 말라 고안카르 협업(David Byrne & Mala Goankar Collaborations), 플레이 온!(PlayOn!) 등을 거론할 수 있다(Wikipedia 2025. 3. 20). 특히, 펀치드렁크는 2003년 「슬립 노 모어」(Sleep No More)의 대대적인 성공으로 이머시브 형태가 공연예술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하였다. 이 작품은 당시 버려진 건물 전체를 무대로 활용하여 관객이 각 층을 이동하며 원하는 순서대로 공연을 감상하도록 했는데(이원림 2022. 9. 26), 이후 영국을 넘어 2009년 보스턴 ART(American Repertory Theatre), 2011년 뉴욕 매키트릭 호텔(Mckittrick Hotel), 2016년 상하이 매키넌 호텔(Mckinnon Hotel) 등으로 진출하였다 (Wikipedia 2025. 3. 25). 이머시브 공연을 하나의 영역으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머시브 공연에서 ‘몰입적 미학’은 여러 감각을 통합하여 느껴지는 체감적 감상에 초점 을 두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호작용 면이 두드러진다. 기존의 전통적인 공연과의 구별은 관객 참여자가 작품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느냐의 여부가 된다. 이때 관객 은 작품 속에서 즉각적으로 자기만의 고유한 시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이머시브 공연의 특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여러 분야 간의 비(非)경계 성을 들 수 있다. 21세기의 하이브리드적인 특성에 맞게 이머시브 공연 역시 여러 분야 간 비(非)경계성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용, 연극, 설치미술, 오브제, 퍼포먼스, 영 화, 인형극, 건축, 사운드, 테크놀로지 등 그 경계는 없어 보인다. 해프닝, 라이브아트, 다큐 멘터리, 리얼리티TV, 비디오게임, SNS, 클럽파티 등의 요소를 끌어당기기도 한다. 이머시 브 공연은 관객의 경험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감각적인 몰입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분야와 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실험을 펼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상과 비일상을 비롯하여 현실과 환상, 공공성과 대중성, 교육성과 오락성 등이 혼재된 특질을 지닌다(정새롬 2019, 25). 다각적인 공유의 경험을 확장하여 상상력을 자극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장 두드러진 특질이라고 한다면 관객의 여러 감각을 자극하여 능동적인 관람을 이끄는 것이다. 이머시브 공연은 극장에서 벗어나 빌딩, 미술관, 거리, 병원 등 일상의 가까 운 공간에서 펼쳐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확장된 공간적 실행은 전통적인 극장에서 무대와 객석이 분리된 관행을 벗어나 공간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공연 과정에 관객 의 이동을 허용하고 추구한다.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뿐 아니라 기존의 관람을 통한 지각 방식을 전복하여 수동적인 수용자로서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서 관객의 역할을 재정립하 기에 이른다.
여기서 관객은 공연의 참여자로서 공간을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동하면서 적극적인 탐사 로써 총체적 감각 체험을 할 수도 있다(허순자 2016, 310-320). 그러한 공간 설계에서 관객은 자발적으로 여러 공간을 옮겨 다니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맡으면서 느낄 수 있다. 이를테면, 디자인된 음향과 자연발생적 소리 심지어 소음이나 침묵까지 그 공간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그 밖에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머시브 공연은 무대와 현실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다. 극장에서 벗 어난 일상 공간의 개입으로 인해 무대와 관람,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흐리고자 하는 시도 들은 이미 환경극이나 장소특정적 공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관객이 몸을 움직이면서 참여한다는 설정에서 예술가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무대 체제가 관객의 관점으로 재구성된 다는 개념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백영주 2015, 111-119).
따라서 이머시브 공연과 장소특정적 공연을 혼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머시브 공연 은 기존 극장 이외의 공간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장소특정적 공연과 공통점이나 유사점 이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장소 특정적 공연과는 그 실천적 의도와 수행적 의미에서 차별화된 이머시브 공연은 독자적 장 르로서 공간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인스톨레이션이나 오브제 등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 서 다(多)매체적인 특성을 짙게 풍기곤 한다.
Ⅲ. 비평적 관점으로 접근한 「헤테로토피아」의 이머시브적 요소
1. 이머시브 공연이 동시대 무용 작품에 미친 영향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머시브 요소를 활용한 컨템퍼러리댄스에 관한 담론을 진척하 자면 자크 랑시에르(Jacque Ranciere 2016)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를테면, 관객을 무대 위에 올리고 공연자가 객석으로 옮겨감으로써 무대와 객석의 엄격한 구분을 제거하는 것 으로부터 공연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나 거리·도시·일상을 공연과 동일시 하는 것이 공연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경우를 이머시브 공연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관객은 일정한 거리를 둔 감상자인 동시에 자신에게 제시되는 스펙터클에 관한 능동적인 해석가’라고 함으로써(김지호 2023, 10-11) 관객 주도적인 사유의 필요성 을 통해 이머시브 공연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머시브 공연은 포스트모더니즘 이래로 행위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활용으로부터 출발하여 관객의 감각을 자극하는 공감각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관객에게 제공한다. 상 호작용 한다는 의미가 좀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그러한 이유로 극장뿐 아니라 거리, 병 원, 미술관, 빌딩 등 일상과 좀 더 밀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공간의 확장은 물 리적인 공간적 이동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 지각 방식을 전복함으로써 텍스트와 우연성 을 모두 수용하게 하여 관객을 능동적 참여자로 재배치한다.
20세기 말을 향해가면서 무용예술은 다각적인 예술성을 표출하였다. 하나의 틀로 고정 하기 힘들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복잡‧다양하게 펼쳐지는 무용예술은 바로 그 시대의 단 면을 반영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면모를 보이는 최근의 무용예술을 컨템퍼러리댄 스로 구체화할 수 있다. 컨템퍼러리댄스는 1980년대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생성 및 정착되 었으며 점차 유럽을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컨템퍼러리댄스 는 그 예술적 확장성, 유연성, 융합성으로 인해 다양한 실험적인 개념을 수용하였는데 그 중에서 이머시브 공연이 있다.
컨템퍼러리댄스 작품 중에서 이머시브 공연 형태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아 그 요소 를 활용하여 창작적 표현 영역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 펀치드렁크의 「슬립 노 모어」 (2011)는 연극과 무용을 스토리텔링과 결합하여 극적인 몰입감을 제공하면서 관객으로 하 여금 자유로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퍼포머와 직접 상호작용 하게 한다. 페르난도 리마 (Fernando Lima)의 「VR Dance Experience」(2018)는 현대무용에 가상현실(VR) 기술을 융합하여 몰입형 공연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관객은 VR 헤드셋을 착용한 채 가상의 무용 수와 함께 움직이며 상호작용 할 수 있다. 잭 필딩(Jack Fielding)의 「Motion Capture Dance」(2022)는 모션캡처 테크놀로지와 인터랙티브 프로젝션을 결합하여 무용수의 움직 임을 실시간으로 3D 환경에서 변형하면서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윌리엄 포 사이드 역시 컨템퍼러리댄스에 이머시브 요소를 끌어들인 무용가로 언급될 수 있다.
2. 윌리엄 포사이드의 이머시브(Immersive) 작품들
20세기 후반부터 무용계 특히 발레계를 혁신적으로 장식하면서 의미 있는 발걸음을 이 어가는 윌리엄 포사이드(William Forsythe, 1949-)는 1976년 첫 안무작을 발표한 이래로 많은 무용가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예술적 실험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내비 치는 그의 안무 스타일은 동시대 무용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포사이드는 동시대의 예술철학, 건축, 음악, 영상 그리고 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았는데, 구체적으로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미 셀 푸코 같은 철학가와 함께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드(Daniel Libeskind)나 전위음악가 톰 빌렘(Tom Willem)을 언급할 수 있다. 무용가 중에서도 루돌프 폰 라반(Rudolf von Laban),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 존 크랑코(John Cranko), 모리스 베자르 (Maurice Bejart), 머스 커닝햄, 피나 바우쉬(Pina Bausch)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영역과 경향을 근간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세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그를 절충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한다(심정민 2011, 139-155).
포사이드의 이머시브 작품들은 세 가지 형태로 실현되곤 하는데, 우선 안무적 오브제 (choreographic objects)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일련 의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한다. 여기서 설치물은 관객으로 하여금 공간을 탐색하면 서 운동적 구조와 상호작용 하도록 이끄는 기재로 작용한다. 관련 작품으로는 「The Fact of Matter」(2009), 「Nowhere and Everywhere at the Same Time No. 2」(2013), 「Black Flags」(2019) 등이 있다.
무대 위 이머시브 공연으로는, 몰입형 연출을 통해 공간적 환상과 관객의 참여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공연자와 관람자 사이에 일방적인 관계성을 깨트린「Decreation」(2003), 「Sider」 (2011), 「Study #3」(2013)가 있다. 더 나아가, 극장을 벗어나서 박물관 등의 공공장소라든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이머시브 공연으로 「Scattered Crowd」 (2002), 「Human Writes」(2005), 「Towards the Diagnostic Gaze」(2013) 등이 있다.
포사이드는 기존의 무용 형식을 해체하고 공간, 관객, 신체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실험적인 안무가로 알려져 있다. 인스톨레이션, 이머시브, 장소특정형 등의 형태로 실천한 사례들은 몰입형 공간을 조성하여 관객이 단순한 감상자가 아니라 작품의 일부로 참여하 도록 유도하곤 했다.
특히, 포사이드의 이머시브 공연들은 기존의 극장식 무대 구조를 벗어나 관객을 공연의 일부로 수용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관객들이 무용 작품을 향유 하는 방식을 재정립하여 단순한 관찰을 넘어 퍼포먼스의 일부가 되게 하는 새로운 공연예술을 추구하 는 것이다. 관객으로 하여금 직접 참여하여 공간과 상호작용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무 용이 단순한 시각적 감상의 대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신체와 환경을 연결 하는 과정(혹은 절차)으로 작용하게 한다. 무용의 경계를 확장하여 건축, 설치미술, 디지털 기술 등과 결합한 몰입형 경험을 창출하기도 한다(심정민 2014, 250-260). 이런 면에서, 이머시브 요소를 내재한 포사이드의 작품들은 ‘공간과 신체의 경계를 해체하는 안무적 실 험’이라고 할 수 있다.
3.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대한 이해
미셀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서양 문명에서 강조해 온 합리적 이성에 관 한 독단적 논리성을 비판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광기(狂氣)라는 비이성적 사고의 진정 한 의미와 역사적 관계를 파헤친 철학자다. 푸코는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이후 서양 철학의 주요 논점의 하나인 시간의 문제 틀을 공간이라는 문제 틀로 변형한 철 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간 개념에 대한 푸코의 인식은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개념과도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1966년 ‘헤테로토피아’와 1967년 ‘다른 공간들(Des espaces autres)’이라는 강연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여기서 후자는 프랑스 건축연구회 컨퍼 런스에서 소개된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에 관한 논의다(푸코 2012, 11).
헤테로토피아(heterptopia)는 그리스어로 ‘다른’을 뜻하는 he'te'ro와 ‘장소’라는 뜻의 topos 가 합쳐진 단어다. 이는 어원적으로 ‘other place’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어딘가에 존재하는 ‘다른 곳’에 대한 관심을 전제로 한다. 또한, 유토피아는 ‘아님’ 혹은 ‘없는’을 의미하는 u와 ‘장소’를 의미하는 topia의 합성어로, 이상적이고 완벽하면서도 현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개념이다(푸코 2012, 11). ‘어디에도 없는 곳’인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부재성을 띠는 가운데, 헤테로토피아는 어딘가 분명히 존재하는 다른 곳인 셈이다.
‘다른 공간들’에서, 푸코는 헤테로토피아가 모든 문화와 문명 속에 실재의 장소로 존재 한다고 한다. 헤테로토피아는 문화마다의 성향에 따라 기능을 달리할 수도 있고, 상호 양 립할 수 없는 여러 공간과 사이트(site)를 하나의 실제적인 장소 속에 병치시키기도 하며 (장정환 2003, 32), 시간을 무한히 축적하기도 한다. 또한 시간의 조각들과 관련되어 있다 고 언급하면서 인간이 전통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단절을 이루게 될 때 완벽하게 기능하기 시작한다(최혜영 2008, 17-19).
그러한 헤테로토피아는 모든 문화와 문명의 현실 장소에 실제로 존재하고 사회의 기본 적 근간에서 형성되었으면서도 반-장소란 개념의 카운터-사이트(counter-site)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구체적 장소 안에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여러 공간을 병렬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서로 양립 불가능한 공간의 배치이고 그로 인해 의미의 상충 과 충돌을 일으키지만, 이질적인 것들의 생소함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푸코는 이와 같은 헤테로토피아에 대해 특이성을 지닌 공간들이라고 말한다. 사회 속의 일반적인 공간들과는 어떤 식으로든 구분되는 절대적으로 다른 공간이다. 이 공간은 보수 적이고 다수적이고 분산적일 수도 있는 이질적인 공간이다. 여기서 이질성이란 특정 사회 가 정상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으로 규정한 경계나 한계를 넘어 위치한 무언가에 관련된 공 간이다.
윌리엄 포사이드는 미셀 푸코의 이론에서 영감을 얻어 동명의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한국에서도 공연하였다. 당시 성남아트센터와 페스티벌 봄의 보도자료에서 포사이 드는 「헤테로토피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헤테로토피아」는 번역의 본질 혹은 번역의 시도에 따른 실패에 관한 성찰이다. 불분명한 욕망이 내재한 모호한 두 개의 지형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이다. 한 영역은 시끄럽고 부산한 초자연적인 가극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인지할 수는 있는 언어들로 공연됨으로 써, 일정 부분 다른 영역을 보완하는 오케스트라로 기능하기도 한다. 다른 영역은 소리를 듣는 생명체들의 집합으로서, 혼란스러운 음악을 이해해 보려는 부질없는 노력이 더욱 기이 한 행위를 초래한다(2013, 2).
포사이드의 「헤테로토피아」는 기존의 무용, 더 나아가 공연예술의 무대와는 다른 특이 하고 기묘하고 이질적인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이는 인스톨레이션(Installation)과 융해하 여 훌륭히 실제화된다. 테이블들을 퍼즐처럼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 빠진 구멍 같은 빈칸을 군데군데 남겨둠으로써 보통의 무대에서 벗어나 있다. 소리에서도 인스톨레이션적인 접근 은 명료하게 실현되고 있다. 음성과 굉음, 소음과 음악 등이 뒤섞이고 혼재되어 평범치 않 은 갖가지 소리는 통의 의미에 대해 재고하게 한다. 이러한 공간과 소리를 활용하는 안무 역시 기이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야기 구조나 내러티브를 배제한 채 꼬고 뒤틀다가 풀리는 움직임은, 언뜻 보기엔 관객을 혼란스럽게 만들 정도로 괴상한 짓거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정민 2013, 5). 이를 근간으로 「헤테로토피아」에 나타난 이머시브적 요소에 대해 비평 적으로 접근하자면 다음과 같다.
4. 「헤테로토피아」에 나타난 이머시브적 요소에 관한 비평적 접근
윌리엄 포사이드는 1970년대 후반 안무를 시작한 이래로 혁신적인 안무가의 하나로 명 성을 얻었다. 그의 예술적인 위업은 이후 등장하는 많은 안무가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 침에 따라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있다. 실험성과 세련미를 모두 함양한 그의 안무 스타 일은 동시대 무용예술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포사이드는 2005년 자신의 이름을 단 무용단을 창단하면서 더욱 혁신적인 방향성을 드 러냈는데, 특히 춤에 인스톨레이션, 이머시브, 장소특정형 등을 담은 실험이 두드러진다. 그의 실험적인 작업 중에서 이머시브 요소를 담은 「헤테로토피아」는 2006년 스위스 취리 히 조선극장에서 초연되었으며, 한국에도 성남아트센터와 페스티벌 봄의 공동 주최로 2013년 4월 10-14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소개되었다.
미셀 푸코가 1967년 발표한 ‘다른 공간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으로, ‘헤테로토피 아(Heterotopia)’란 단어 자체가 이소성(異所性)이나 이상 서식지란 뜻을 지닌 만큼, 푸코 의 ‘헤테로토피아’ 또한 다르고 낯설고 다양하고 혼종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성 남아트센터 & 페스티벌 봄 2013, 2). 이를테면 극장, 박물관, 유원지, 정신병원, 묘지, 감옥 등은 사회와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일상으로부터 일탈하거나 모순된 기이한 장소인 것이다. 포사이드의 「헤테로토피아」 역시 일반적인 춤 공연과는 다른 공간으로 관객을 끌 어들여서 두 개의 공간을 직접 옮겨 다니게 했다. 가운데 막을 쳤으나 통로가 열려있는 형태의 두 공간은 반대쪽의 소리가 들리도록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하였다. 그러한 방식 으로 관객이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관람하도록 유도하였다. 컨템퍼러리댄스에서 이머시브 요소를 끌어온 사례로써 새로운 감상 경험을 줌으로써 확장된 접근성을 관객과 함께 완성 하는 것이다. 다음의 논의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미셀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구현 한 윌리엄 포사이드의 <헤테로토피아>”(심정민 2014)가 있음을 밝힌다.
1) 공간의 해체와 인스톨레이션
윌리엄 포사이드는 스스로 명명한 ‘불분명한 욕망을 담은 모호한 두 개의 지형’을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논의의 명확성을 위해 두 개 의 지형을 공간 α와 공간 β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헤테로토피아」에서의 공간 설정은 매우 독특하다. 극장 공연예술로서의 무용은 보통 무대 위에서 행위가, 객석에서 관람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띤다. 하지만 포사이드의 「헤테로토피아」는 관객을 객석이라는 익숙한 공간으로 이끌지 않으며 불편하고 기이한 공간인 무대 뒤로 입장시킨다. 무대 또한 완전히 달라 보이는 공간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막을 사이에 두고 대극장의 주 무대를 공간 α로, 무대 뒤 스튜디오 형태를 공간 β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공간 α에서는 커다란 테이블들이 불규칙하게 대열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군데군데 비워진 공간이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커다란 단을 이루고 있다. 무용수들은 테이블들로 설치된 단의 위아래를 오가면서 괴상한 행동을 벌인다. 이전 무용 작품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인스톨레이션을 갖춘 공간이다. 대부분의 관객이 테이블 위를 간이무대 삼아 움직 이는 무용수들을 관람하는 가운데, 소수의 호기심 많은 관객은 테이블 아래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관찰한다. 이러한 행위 공간은 전체적으로 정사각형 모양을 띠면서 네 방향의 관람 을 유도한다. 일반적인 극장에서 ‘보이는 무대 앞면’과 ‘감춰진 뒷면’이라는 고정관념을 상 실한 공간인 것이다.
주 무대에 있는 공간 α와 구분되는, 막 뒤의 공간 β는 스튜디오형 공간으로 악기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설치물 없이 무용수들의 움직임 자체에 몰두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무용 공연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형태에 가까운 공간이지만, 그러한 공간 β조차 특이성을 지닌 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마이크와 스피커 또는 조금 열린 커튼을 통해 공간 α와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간 α에 설치된 마이크는 공간 β의 스피커를 통해 끊임없이 공간 α에서 나오는 갖가지 소리 이를테면 음향과 소음을 공간 β에 흘려보낸다. 두 공간을 구분하는 막은 양쪽 끝이 어느 정도 열려있어 관객이나 무용수에게 두 공간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한다. 상대적으로 평범할 수 있었던 스튜디오 형태의 공간 β는 공간 α와의 관계 속에 평범할 수 없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간 α와 공간 β는 한 공간을 이루는 이질적인 두 영역으로, 전통적 인 극장에 대한 공간의 해체를 특질로 하는 이머시브 공연의 특질을 보이고 있다.
2) 사운드 인스톨레이션-언어와 음악
윌리엄 포사이드의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인지할 수는 있는 언어들’은 공간 α에서 가 장 표면적으로 감지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관객이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입구 쪽에 대부분의 알파벳을 세워놓고 이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재배치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사 용하는 단어의 배열이 아니라 읽을 순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듯한 배열이며 이는 <도판 1>과 <도판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파벳은 언어의 기본 단위로 여겨왔거나 익숙하게 다뤄져 왔으나 그것의 재배열은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을 야기한다. 이는 알아들을 수 없 는 다른 나라 언어나 더 나아가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한 괴성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포사이드가 ‘혼란스러운 음악’이라 표현하였다시피 갖가지 소음과 어우러진 음악 또한 전통적인 무용 작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환기한다. 소음과 겹쳐 흐르는 음악은 너무 잔잔하 고 작은 관계로 그 선율을 제대로 듣기 힘들며 특히 춤을 출 수 있는 기본적인 박자마저 잘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과 일체감을 보이는 춤 동작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일상적이지 않은 혹은 완전하지 않은 듯한 언어와 음악의 파편들은 소통이라는 의미에 관해 재고하게 한다. 이는 이머시브 요소의 하나로 일컬어질 수 있는 언어적이고 음악적인 사운드 인스톨레이션이라는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3) 전통적 테크닉에서 벗어난 움직임
월리엄 포사이드의 춤은 발레이긴 한데 괴상한 몸놀림을 가진 발레다. 동시에 감각적이 고 실험적이고 세련되기까지 한, 그야말로 오묘한 발레를 무대 위에 펼쳐놓는다. 아름다운 발레를 절단하는 파괴자나 이단아로 불리는 것도 이해될 만하지만 다른 한편 구태의연함 을 거부하는 21세기형 혁신자라고도 할 수 있다.
급진적인 성향이 부각 되어 있긴 하지만 포사이드는 근본적으로 발레의 전통적인 테크 닉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그는 ‘고전발레의 표현 방식’에 대해 ‘결코 낡았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훈련받은 발레 무용수들과도 작업해 왔다. 고 전적인 테크닉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 형태를 동시대에 맞게 변화시켰다는 점이 그의 춤을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리라 본다. 발레에 근간을 두면서도 구조화된 규범에서 탈피하여 기존의 무용 기법을 뒤집는 동시에 전통적인 요소 안에서 무 질서를 끌어내려 한 것이다.
포사이드는 발레의 전통적 어휘를 재고하여 그것을 환기하는 방법으로서 절단하는 특질 을 창조해 냈다. 신체의 전통적인 선형성을 거부하고 신체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독립적 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몸의 각 부위를 분리하여 움직이고 각 관절을 나 눠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뒤틀렸다 풀리는 특유의 움직임은 이러한 원리로부터 출발한다. 팔다리가 움직이는 방식에서도 기존의 정형적인 유형은 찾아보기 힘들다.
포사이드의 움직임은 기존의 발레에서처럼 뚜렷한 동작 구분이나 정해진 방향성 없이 이루어지곤 하는데, 발레를 ‘해체’하였다든가 ‘탈구축’하였다든가 하는 말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체되고 탈구축된 움직임이야말로 헤테로토피아라는 소재를 구현하 는 독특성을 띤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포사이드가 이 작품에 대해 ‘혼란스러운 음악을 이해해 보려는 부질없는 노력이 더욱 기이한 행위를 초래한다’라고 설명했듯, 헤테로토피아의 이질성은 공간이나 언어와 음악뿐 아니라 무용의 본질적인 요소인 움직임에도 투영되어 있다.
여기서 움직임은 두 개의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큰 공간에는 테이블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마치 하나의 무대 단(壇)처럼 보인다. 무용수들은 그 사이사이의 빈 틈을 돌아다니거나 그 위에 올라가 기묘한 행태를 벌인다. 알파벳 모양의 오브제를 만지작 거리다가 짐승처럼 울부짖기도 하며, 몸을 뒤틀고 풀었다 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힐 끗 보기에 미친 짓거리 같지만 현대 사회의 부조리함을 날카롭게 찌르는 구석이 있다.
그보다 작은 공간은 보통의 스튜디오를 떠오르게 한다. 장치나 소품에 의한 공간적 제약 이 적기 때문에 포사이드 특유의 움직임을 좀 더 선명하게 음미할 수 있다. <도판 3>과 <도판 4>에서처럼 신체의 여러 부분을 분리하여 각 관절을 독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독 특하게 뒤틀렸다가 풀리는 움직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사전 조작보다는 즉흥성을 선 명하게 드러내는 특질 역시 뚜렷하게 감지된다.
여러 명의 무용수는 다른 공간에서 놓여 있거나 다른 언어와 음악을 사용하면서도 하나 의 작품을 이루는 인물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공간이나 언어와 음악 에 나타난 헤테로토피아적인 이질감과 유사한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의미와 진실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또 다른 가능성을 여는 움직임으로써 말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관객들에게 실험적인 연행 즉 이머시브 퍼포먼스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4) 관객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선
한국에서 2013년 소개된 「헤테로토피아」는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라는 대극장의 무대를 재구성하여 한 자리에서 행위와 관람을 이끄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300명 의 관객만 수용하여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관찰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머시브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관객에게 이질적인 두 개의 공간을 마음껏 탐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작금에 이르러서는 익숙한 연행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공연장에서 펼 쳐지는 무용 공연임을 고려하면 파격이 아닐 수 없었다.
두 개의 공간은 중간에 막으로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자유자재로 이동할 통로가 열려있 는 형태인데다가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각각 반대쪽과 소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특정 공 간에 있는 관객에게 다른 공간의 상황에 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공간 α에 있으면 공간 β가 궁금하고, 공간 β에 있으면 공간 α이 궁금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잦은 이동을 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두 공간에 이루어지는 무용수들의 전방향적인 행위 역시 관객들에게 어떤 위치와 각도에서든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시선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공간 α의 경우 양옆으로 그리고 공간 β의 경우 한쪽으로 간이객석이 마련되어 있으나, 앉거나 서서 심지어 누워서 관찰하는 관객도 있었다. 전통적인 극장 시스템에서 무대와 객석이라는 고 정된 방향을 의식하면서 행위와 관람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면 관객에게 평범하지 않은 이질적으로 열린 시선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관객의 임의조합과 자각을 유도하는 컨템퍼러리댄스의 예술적 특질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듯 「헤테로토피아」는 공간, 언어와 음악, 움직임뿐 아니라 관객의 시선에 관해서도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평범하 지 않은 이질적인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실제화하고 있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포사 이드의 동명 작품에서 급진적인 실험성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확립된 것이다.
「헤테로토피아」는 이전에 봐왔던 무용 작품들과는 사뭇 다르다. 초연된 2006년의 관객 들에게 익숙지 않은 불편함을 주기도 했겠지만 난해하지만 새로운 퍼포먼스나 설치미술을 감상하듯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동시대의 개념과 실험의 결과물, 정확히는 이머시브 공연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포사이드의 「헤테로토피아」는 무용수와 관람자가 변화된 실재를 경험하는 몰입형 변화 공간인 헤테로토피아 환경을 구성한다. 포사이스의 작품들은 종종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 는 파괴적이고 층층이 쌓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방해하고 신체 인식을 재구성하며 관객을 능동적인 참여자로 끌어들이는 이소성 공간을 구성한다. 이러 한 공간은 질서와 무질서 혹은 물리성과 추상성 사이에 존재하며, 그 속에서 사운드와 움 직임을 재구성한 일시적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헤테로토피아」에 나타 난 포사이드의 이머시브적 접근 방식은 공간 해체와 인스톨레이션,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전통적 테크닉에서 벗어난 움직임, 관객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선으로 정리될 수 있다.
Ⅳ. 결 론
이머시브 공연의 개념은 멀리는 1968년 미국 연극학자 리차드 쉐크너가 생활 속 모든 환경이 공연을 위해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 환경연극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머시브 공연은 관객과 예술 사이에 벽을 허물면서 관찰자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중요 시한다. 이머시브 공연에서 ‘몰입적 미학’은 여러 감각을 통합하여 느껴지는 체감적 감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일종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적인 면이 두드러진다. 기존의 전통적인 공 연과의 구별은 관객 참여자가 작품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느냐의 여부가 된다. 이때 관객은 작품 속에서 즉각적으로 자기만의 고유한 시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머시브 공연의 특질을 살펴보면, 우선 여러 분야 간의 비(非)경계성을 들 수 있다. 또 한 관객의 여러 감각을 자극하여 능동적인 관람을 이끈다. 여기서 관객은 공연의 참여자로 서 공간을 이동하면서 적극적인 탐사를 함으로써 총체적 감각 체험이라는 독특한 여정에 임할 수도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무대와 현실의 경계를 희미하게 한다. 극장에서 벗어난 일상 공간의 개입으로 인해 무대와 관객,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흐리고자 하는 시도들은 환경연극이나 장소특정적 공연에서도 나타나는 바다.
이머시브 공연은 포스트모더니즘 이래로 행위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활용으로부터 출발하여 관객의 감각을 자극하는 공감각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관객에게 제공한다. 공 간의 확장은 물리적인 공간적 이동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 지각 방식을 전복함으로써 텍스트와 우연성을 모두 수용하게 함으로써 관객을 능동적 참여자로 재배치한다. 자크 랑 시에브 또한 ‘관객은 일정한 거리를 둔 감상자인 동시에 자신에게 제시되는 스펙터클에 관한 능동적인 해석가’라고 함으로써 관객 주도적인 사유의 필요성을 통해 이머시브 공연 개념을 제시하였다.
동시대의 혁신적인 창작 춤을 의미하는 컨템퍼러리댄스는 1980년대부터 프랑스와 벨기 에 등 서유럽에서 생성, 정착, 발전되었으며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작금에 이르고 있다. 컨템퍼러리댄스는 그 예술적 확장성이나 융합성으로 의해 다양한 실험적인 개념을 수용하였는데 그중에서 이머시브 공연이 있다. 동시대의 혁신적인 안무가인 윌리엄 포사 이드는 현대의 예술철학, 건축, 음악, 영상 그리고 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영감을 얻고 영향을 받아왔다.
이머시브 요소를 내재한 윌리엄 포사이드의 「헤테로토피아」는 미셀 푸코의 「다른 공간 들에 관하여: 헤테로토피아」(1967) 중에서 다른, 낯선, 다양한, 혼종된 공간이라는 의미에 서 영감을 얻어 2006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일반적인 춤 공연과는 다른 공간적 개념으로 관객을 끌어들인 것이다. 포사이드의 「헤테로토피아」는 무용수와 관람자가 변화된 실재를 경험하는 몰입형 변화 공간인 헤테로토피아 환경을 구성한다. 포사이스의 작품들은 종종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파괴적이고 층층이 쌓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방해하고 신체 인식을 재구성하며 관객을 능동적인 참여자로 끌어들이는 이소성 공간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간은 질서와 무질서 혹은 물리성과 추상성 사이에 존재하며, 그 속에서 사운드와 움직임을 재구성한 일시적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헤테로토피아」에 나타난 포사이드의 이머시브적 접근 방식은 공간 해체와 인스톨레이션,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전통적 테크닉에서 벗어난 움직임, 관객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 선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근래 들어 컨템퍼러리댄스에 이머시브를 활용한 확장적인 창작 형태가 시도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국내 무용계에서는 여전히 그에 관한 탐구적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관계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국내에서도 이머시브적인 요소를 반영한 무용창작이 늘어나는 추세로 차진엽의 「로튼 애플」(2013), 이정연의 「루시드 드림」 (2019), 김성용‧유재헌의 「The Object」(2021), 김성한의 「슬리핑뷰티」(2023), 차수정의 「반가: 만인의 사유지(思惟地)」(2024), 조인호의 「서양극장 속 한옥」(2024), 최상철의 「민 주주의에 말을 걸다」(2025)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앞으로 관련 논의의 심층화에 있어 해 당 연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