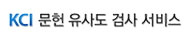Ⅰ. 서 론
무용 현장성은 라바노테이션(Labanotation), 베네시 기보법(Benesh Movement Notation), 미디어 아카이브(media archive)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들이 축적되어왔다. 그러나 시대에 맞춰 춤의 문화적 코드를 온전히 보존하고 재현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기록물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전략들이 검토되고 있으나 파일 변조 가능성, 중앙화와 탈중앙화 간의 가치 충돌, 지적 재산권 문제로 인해 데이터셋(dataset) 적용은 쉽지가 않다. 그 가운데 온라인 아카이브(online archive)의 확산은 사회참여 예술로서 무용 기록물의 공유적 가치를 확장 시키고 있다. 특히 전문 기관과의 디지털 연계성은 조합형태의 컨소시엄(consortium)을 형성, 파트너 맵(map)차원에서 무용 기록물을 저장,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물론 여기에는 원본성(authenticity) 검증, 저작권 문제, 장기 보존의 취약성 같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데이터 경제 시대 무용 예술이 생존하려면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 (online contents)를 통한 커뮤니티(community)확대는 무용 기록물의 수익화와 블렌딩 (branding)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한다.
2020년 이후 본격화된 스트리밍 플랫폼(streaming platform)은 일부 콘텐츠가 미디어 아트(media art)나 서브컬쳐(subculture)로 소비될 만큼 무용 시장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다. 무용공연, 영상 기획 플랫폼인 아츠인탱크(ARTSinTANK)는 춤을 기록하고 유통하 는 뉴미디어 방식을 통해 대중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무용공연을 접할 수 있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그 외 국립극장 아카이브인 별별 스테이지를 비롯해 국악 아카이 브,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와 같은 공공플랫폼의 등장은 무용의 일회적 경험 을 매몰 비용으로 소멸시키지 않고 디지털 재화로 전환 시키는 생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따른다. 디지털이든 아날로그 방식이건 예술작품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원본에 대한 ‘진본성(authenticity)’과 ‘대체 불가능성(non-fungibility)’ 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무용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 콘텐츠 욕구가 다양해질수록 디지털 환경에서 예술작품들은 가성비 높은 경험적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작품의 단위를 축소하는 소분화 작업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미디어 영상의 경우 기록의 오리지널(original)이 모바일 데이터에 맞춰 축약 되거나 탤런트(talent)적인 측면만 부각 될 수 있어 아카이브와 알고리즘(algorism) 유통 사이의 경계적 균형이 필요하다. 특히 무용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대중의 접근성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였지만 ‘원본’의 가치 보장과 콘텐츠 화제성을 모두 포함한 새로운 물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필자가 블록체인(Blockchain)과 NFT(Non Fungible Token)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거래 내역을 공개적으로 기록하는 기술로 블록체인 외부에 저장 되어 발행(minting)된 NFT(인중서)가 토큰화되어 현실경제와 동일한 가치를 획득할 수 있 게 한다. 이러한 NFT 기술이 디지털 작품이나 기록물에 적용되면 원본증명이 가능한 디지 털 자산이 되어 상업화는 물론 기록물로서 희소적 가치 구현이 가능해진다. 물론 그렇다고 NFT를 무 비판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다만 무용 플랫폼의 종속 여부와 산업 시장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NFT는 기술적 활용 가능성을 두고 논의할 가치가 있다.
NFT 아트 시장의 급성장은 단순히 디지털 재화성(digital commodification)만으로는 설 명되기 어렵다. NFT 아트의 상징성에는 재화성을 넘어 ‘소유권’과 ‘대체불가증명’, ‘희소 성’ 등, 이른바 원본에 대한 가치증명이 결합 되어있다(김정은 2021, 2; Quaranta 2010, 121). 앞서 기술했듯이 NFT의 기술적, 개념적 핵심은 ‘대체 불가능성’이다. 그런데 NFT라 는 메타데이터가 고유한 표식을 부여받기까지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 반드시 필 요하다. 블록체인은 NFT의 미학적 가치인 희소성을 부여해주는 기술로서 한번 생성되면 삭제되거나 위조될 수 없게 저작물의 모든 거래 내역을 직접 저장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이러한 특징은 초기 NFT 아트의 혁신적인 출발점이 되었다(성소라, Hoefer, McLaughlin 2021, 27).
2012년부터 2016을 NFT의 시초라 불리는 이유도 블록체인을 통해 밈 트레이딩 카드 (meme trading card) 등, 독창적인 디지털 아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성소라, Hoefer, McLaughlin 2021, 52). 특히 2021년을 기점으로 등장한 크립토 아트(crypto art) 는 기존 아카이빙(Archiving) 형식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다. 실례로 2014년 소더비 경매 에서 한화 16억 원에 낙찰된 「퀀텀(Quantum)」의 경우 ‘최초의 크립토 아트’라는 평가만 으로 작품의 희소성은 배가되었다(김민지 2022, 21). 이 같은 사례 이후 주요 경매사에서 는 크립토 아트에 대한 컬렉팅(collecting)이 급증했고 수많은 작가가 NFT 아트에 진입, NFT를 민팅(minting)하고 판매하는 새로운 환경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용 역시 ‘서울예술인 NFT’ 사업(2022년)을 통해 무용수나 공연기록을 NFT로 민팅 시키는 콘텐츠 를 기획한 바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무용 NFT가 컬렉터(collector)들의 구매 욕구를 얼마만큼 자극할지는 사실 의문이다.
NFT의 철학, 커뮤니티성(communal nature)을 고려하면 무용 NFT는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 발전에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선례가 될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무용 기록물이 NFT 아트로서 산업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용 예술의 가치를 디지털 가치로 전환하는 내러티브 전략이 필요하다. 리들 프란시스(Liddell, Frances)는 라이브 민팅(NFT)이 기존 아카이빙을 참여형 기록으로 탈바꿈시켰다고 보고 전시 현장에서의 직접기록이 하나의 트렌드(trend)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Liddell 2023, 15). 오드와이어 레이철(O’Dwyer, Rachel)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아트의 유통 수익구조를 더욱 유연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O’Dwyer 2018, 894). 오드와이어의 예상대로 현재, NFT는 예술작품에 대한 기록은 물론 진본성에 대한 희소성을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용 NFT는 어떠한가? 전시화된 영상 수집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저작인접 권, 작품에 대한 라이센스(license) 등 아직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사항이 존재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대한 진품성, 영속성, 거버넌스(governance)의 분산 등, 활 용 가능한 유용성이 존재하고 있어 기술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요구된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 탈 중앙형 아카이브(decentralized archive) 역시 중앙집중식 관리모델을 보 완하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앞으로 상호운용성이나 절차 면에서 더욱 현실성 있는 단 계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 같은 당면과제를 뒤로하고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본성에 대한 가치증명과 희소성이다. ‘원본성’, ‘가치증명’, ‘희소성’의 요소들은 무용 NFT(Dance NFT) 존재 여부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Bench & Elswit 2020, 292; Leonhard, Martin & Björn 2022, 3; Liddell 2023, 271).
무용 NFT의 희소성 미학을 논의한 김민지, 차수정(2025)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아우라(aura)’를 우회적 예시로 들어 NFT의 기술적 유용함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논점에서 간과된 NFT의 양면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예컨대 마켓플레이스 (marketplace)에서 100개의 에디션 작품을 판매할 경우 NFT의 ‘대체불가(non fungible)’ 는 언제든 ‘대체가능(fungible)’으로 역전, 희소성의 가치가 교환 가능의 미학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NFT가 가진 교환 가능의 가치는 홍원준, 안동근(2023)의 “NFT 기부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NFT의 고유성과 희소성의 가치는 소속감과 경제성, 투명성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 기획자나 창작자가 사용권과 소유권을 구분해 원하는 수량만큼 NFT로 작품을 발행해 기부할 경우 NFT의 희소성은 ‘가치교환’이라는 경제적 거래를 통해 그 본질을 체험할 수 있다고 밝혔 다(289).
그 밖에 주선영(2024)은 디지털 아카이브 확장에서 사용자 경험 구축의 중요성을 제기 하였는데, 원본성과 기록 증식 관점에서 무용 NFT를 제안해보면 사용자 경험의 구축은 기록에 대한 소비 커뮤니티에 있는 것이 아닌 ‘대체가능’과 ‘대체불가능’의 정보 교환 속에 서 전략적인 해답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용 기록물에 대한 보존, 교환가치, 재현의 윤리를 주요 논제로 두고 무용 NFT의 가능성과 쟁점이 탐색 되었다.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블록체인 기반 NFT 작품 사례와 기록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
둘째, 자본이 되는 기록, 무용 NFT의 가치는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
-
셋째, 역사적재현물로서 무용 NFT의 윤리적 쟁점은 무엇인가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와 사례분석(case analysis)이 적용되었다. 자료수 집의 경우 리스(RISS)와 사이스페이스(SciSpace), 틀루투(tlooto) 등,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 지원 플랫폼이 활용되었으며 2010년부터 2025년 사이에 발간된 국내 외 학술지들이 주 자료로 검색되었다. 검색 키워드로는 블록체인, NFT, 디지털 아카이빙, 무용 기록, 탈중앙 화, 진본성, 원본성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수의 관련 문헌들이 참고되었다.
사례분석의 경우 최근 5년간의 국내 온라인 뉴스들이 참고되었으며 연구자의 ‘직접 해 석(direct interpretation)’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판 1>은 방법론적 절차에 대한 간 략한 모형이다.
NFT 아트로서 무용 기록물의 가능성 검토는 단편적인 보존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문화 적 자산으로서 잠재적 가치의 중·장기성을 확인해보는 절차가 될 것이다.
Ⅱ. 블록체인 기반 NFT 작품 사례와 기록의 특징
1. 중앙집중형 디지털 기록방식과 NFT 기록방식의 특징
무용 기록물에 대한 기존 디지털 보존방식은 중앙집중형 서버나 특정 기관의 관리 시스 템에 의해 작동되어왔다. 여기에는 데이터 변조, 서버 장애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에 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확대, 콘텐츠를 저장하는 플랫폼 형식의 아카이브 모델들이 등장하 고 있다. 콘텐츠 중심의 아카이빙의 경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download) 제공을 통해 무 용 기록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특징은 오픈소스 리포 지터리(open source repository)시스템을 사용해 포스터나 공연영상을 큐레이션(curation) 하는 시각적 기록이 특징이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단점으로는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나 유 통의 제한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의 장점은 기록 관리 면에서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대중적 니즈(needs)를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유정, 유진주 2025, 206; 김정은, 유지영 2022, 167; Whatley 2014, 135).
아누파마 말릭(Anupama Mallik), 산타누 차우두리(Santanu Chaudhury), 히란마이 고 쉬(Hiranmay Ghosh)는 인도 고전무용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을 위해 멀티미디어 온톨로지(Ontology) 구조를 도입, 그 결과 미디어 패턴 통해 동작에 대한 의미 검색은 가 능하였으나 공연에서의 다양한 움직임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Mallik, Chaudhury, Ghosh 2011, 11-25).
윙(Wong)과 추(Chiu) (2024) 역시 압축보관 과정에서 디지털 큐레이션 전략에 대한 분 석을 시도하였는데 웹사이트 내, 콘텐츠 기록 수집은 용이하나 소셜미디어의 경우 기술적,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Wong & Chiu 2024). 사라 왓틀리(Sarah Whatley)의 경우 “댄스아카이브(21): 시오반 데이비스 온라인(Archives of the Dance(21): Siobhan Davies Dance Online)”이라는 주제로 안무가와 아카이브 사용자 간의 협업적 인터페이스 (interface) 구축을 시도하였으나 사용자에게 해석 공간에 대한 한계와 기록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다(Whatley 2008, 257). 제시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디지털 기록물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다양화와 기록 추적의 용이성 등, 확장된 인프라 증설의 필요성이 공통으로 제안되고 있었다.
반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 기술은 중앙집중형(centralized)과 탈중앙형(decentralized)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아카이브(hybrid archive) 모델로써 디지털 아트의 진본성 검증의 도구로서 인정받고 있다. 우선 NFT의 기록방식을 살펴보면 단순히 원본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을 넘어 NFT 작품의 실제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컬렉팅(collecting) 활동이 중요하다.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가 기관 리포지터리(institutional repository)에 의존해왔다면 NFT 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원작자가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Fernandes, Coelho & Vieira 2020, 275). 또한, 이러한 전 과정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구조를 기반으로 고유 식별자를 부여, 소유권과 기록의 진본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Stublić, Bilogrivić & Zlodi 2023, 3804).
블록체인 암호화에 의해 발행된 NFT는 각 토큰(token)마다 고유한 값을 지니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용이나 예술작품을 기록하고 그 기록물에 대한 가치를 논할 때 충분히 원본으로서의 진본성과 희소성을 증명해줄 수 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은 원본(NFT)을 발행하고 변조할 수 없도록 토큰의 위치를 계속 기록하는 가계장 부로 이해하면 된다. 그 결과 온라인상에 떠도는 무수한 복제품(이미지)과 달리 NFT는 인 증된 원본으로서 디지털 자산이 된다. 결국, 블록체인의 분산저장 기술은 중앙화된 서버와 같이 기록물에 대한 공공 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소유권을 증명, 보다 유연한 기록 물로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블록체인 기반, NFT 작품 사례
스포츠의 경우 2021년도를 시작으로 선수나 팀 경기를 토큰화(NFT)시켜 거래하는 스포 츠 컬렉터블(sports collectibles) 플랫폼을 꾸준히 구축하고 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컬 렉터블(collectible)은 맞춤형 포토카드(photocard)로 아이돌 앨범을 구매하듯 팬이 직접 좋 아하는 선수 사진을 구매할 수 있어 경기관람 못지않게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스 포츠 컬렉터블은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써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민팅(minting)을 통해 NFT별 소유권을 보증받게 된다. 발행된(minting) NFT의 경우 한번 생성되면 삭제되거나 위조될 수 없기에 원본 인증서 혹은 소유권 증명서로 기능을 하게 된다.
국내외 스포츠 시장에서의 대표적인 NFT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place)로 는 NBA 톱샷(Top Shot)과 소레어(Sorare), 제드 런(Zed Run)등이 있으며 해당 플랫폼에 서 NFT는 언제든 암호화폐로 교환이 가능하다. 한국의 대표적 마켓플레이스인 블루베리 NFT나 코빗(korbit)도 경기 속 명장면을 토큰화하여 판매하는 등, 스포츠 경기표부터 실 물 굿즈(goods)까지 다양한 NFT 상품들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도판 2, 3>의 스포츠 NFT(sport NFT)에서 사진 왼쪽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 사진을 대체불가 토큰(NFT)으로 발행한 사례이며, 오른쪽 사진은 배구선수 양효진의 경기 명장면을 기록한 NFT이다.

도판 2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 ‘팀 코리아 NFT 2022’ 완판행진(Opening of the 2022 Beijing Winter Olympics, “Team Korea NFT 2022” plaque parade)”. 2022.2.4. 한국경제TV.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 /215/0001012958

도판 3
“코빗, 블루베리메타, ‘한국프로배구 NFT’ 선보인다(Korbit, Blueberry Meta, “Korea Professional Volleyball NFT)” 이원용. 2022.11.11. 글로벌이코노믹. https://www.g-enews.com/ko-kr/news/ article/news_all/202211111133574968c5fa7 5ef86_1/article.html
스포츠 NFT 상품의 경우 아날로그 방식의 상품을 함께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거부 감을 줄이며 역사적 기록물이자 개인 소장품으로 스포츠 시장에서 희소성을 획득해가고 있다. 스포츠 시장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계에서도 NFT는 기록물 이상의 가 치가 부여되고 있다. 과거에는 전시관이나 미술관 같은 현장 중심의 수집과 기록이 이루어 졌다면 현재는 NFT 플랫폼을 중심으로 커뮤니티(community)가 옮겨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NFT 아트가 어떤 면에서는 실물작품보다 더 높은 미적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는 사실 이다. 2023년에 한국 최초로 개최된 크립토 아트 서울 2023(Crypto Art Seoul 2023)에서 는 국내외 유명 디지털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해 새롭게 미술 작품들을 전시한 바가 있다. 이때, 가장 파격적인 작품으로 주목을 끈 것은 크립토 아트(Crypto Art)였다.
크립토 아트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아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립토 아트는 디지털 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써 NFT 아트를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탈중앙화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암호기술 생태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종종 NFT 아트와 동의어처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 다. 그러나 정확히 크립토 아트는 NFT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위에 원본에 대 한 진위성과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토큰화된 예술로 정의되고 있다(De Filippi 2015, 4).
대표적인 크립토 작품으로는 ‘불탄 뱅크시(Burnt Banksy)’ 와 매드 독 존스(Mad Dog Jones)의 리플리케이터(Replicator)가 있으며 2025년 최근, 필립스(Phillips)에서 경매된 작 품으로는 페데리코 루거(Federico Ruger)의 ‘나는 NFT를 판매합니다’(추정가격, 한화 1,050만 원)가 있다.
크립토 작품이나 NFT 작품의 희소성은 가격과 직결된다. 사실 NFT 아트에 대한 가치 평가는 전통적인 예술작품에 비해 평가의 폭이 넓어 일반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작품 의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NFT 아트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소적 가치를 지니며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도판 4>는 필립스(Phillips) 플 랫폼에서 경매, 전시되고 있는 크립토 아트와 NFT 작품에 대한 사진이다.

도판 4
PHILLIPS 플랫폼에 경매되고 있는 크립토 아트와 NFT 아트 (Crypto art and NFT art auctioned on the Phillips platform), 필립스 홈페이지
무용 NFT의 경우 안타깝게도 수익성과 인지도 측면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지 못 해 현재 활발한 모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소수 특정 NFT 마켓 거래소에서 진열 되고는 있지만, 그것도 재단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일시적으로 판매되고 있을 뿐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K팝 댄스의 경우 K-댄스 문화에 힘입어 NFT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데몬 헌터스 NFT를 들 수 있는데 콘서트 티켓부터 굿즈까지 플랫폼 내 댄스 영상이나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K-팝 토큰으로 판매 중이다(이규화 2025).
무용이 여타의 문화콘텐츠처럼 NFT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과 차별화된 디지털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NFT는 희소성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경제적 활로를 생산 중이다. 무용이 NFT의 모든 비전을 함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용의 실체화, 자기 증식의 표현, 움직임의 자산화, 동작에 대한 소유를 증명함으로써 무용 기록물의 희소적 가치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Ⅲ. 자본이 되는 기록, 무용 NFT의 가치
서울문화재단에서 기획한 ‘서울예술인 NFT’는 2022년부터 2025년 3월 31까지 메타갤 럭시아(MetaGalaxia)와 연계해 무용 NFT를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다. 3년 동안 서울 예술인에서 NFT로 민팅한 작품 수를 살펴보면 2024년, 총 7편의 작품들이 NFT로 발행되 었으며 2023년에는 9편, 2022년 7편의 카드 토큰이 에디션(edition) 형태로 판매되었다.
NFT 시장에 무용이 참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록의 콘텐츠화를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다. 특히 무용 NFT는 현재 신생컬렉션으로 불릴 만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NFT의 미적 희소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문화콘텐츠 접점에서 무용의 글로벌적 비전과 스타 파워의 낮은 신뢰성을 들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무용 NFT의 경제적 가치를 수익성 만 놓고 평가할 순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술 작품들이 실물과 연계해 독창적인 NFT 내러티브를 만든 것처럼 무용 역시 충분한 시간이 투자된다면 고전과 현실을 넘나드는 NFT 예술관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 가지가 확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기록물 보존과 별로도 ‘살아있는 기록’으로서의 확장을 꾀해야 한다. 예를 들면 관람 경험을 커뮤니티 가치로 잡고 작품의 창작 과정과 리허설 전 과정을 리미티드 스트리 밍으로 연결하는 등, 구매자가 주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념물을 제작해야 한다(Guan et al. 2024, 7386; Laura 2013, 124; Liddell 2023, 268). 무용은 시간에 기반을 둔 기록물로 써 움직임의 확장성을 즉각적으로 전달받는다면 무용 NFT만의 아날로그 물성을 체험할 수 있다. 더불어 ‘경험과 기록’이라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위해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NFT 아트에서 실제적인 가치는 커뮤니티에 있다. NFT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자신만의 스토리를 코인에 새김으로 써 고유한 내러티브(narrative)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결국, NFT 아트로서 무용이 희소성 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얼마만큼 직관적인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커뮤니티의 환경 설계이다. NFT 아트의 가치 지 탱은 소유자와 잠재적 구매자 간의 가치 형성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관객과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해당 작품을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NFT 아티스트와의 공동작 업도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창작자의 권한 강화와 수익 배분이다. NFT 아트는 판매와 재판매 기간이 짧아서 NFT 거래 시 작품의 저작권, 지식 재산권과 같은 양도하지 않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원작가에게 소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김민지 2022, 312).
무용이 NFT 아트로서 내러티브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NFT 시장에 투자 목적 을 두고 다양한 작품의 아우라를 경험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시간과 정보에 대한 데이터 를 확보해야만 기록물의 안정성과 재현의 주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Ⅳ. 역사적재현물로서 무용 NFT의 윤리적 쟁점
NFT 기술은 무용 기록의 보존과 접근성, 공유방식에 있어 새로운 차원의 수익 창출을 경험하게 한다. 이는 곧 상징적·문화적 자본(symbolic and cultural capital)으로서 무용의 가치를 확장 시키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그러나 NFT의 가치가 단순히 진본성(authenticity)과 희소성(scarcity)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용이 기록화되고 보존되는 과정에서 확보되는 희소성의 가치는 바로 생생한 재현성(vivid representational fidelity)에 있다.
무용에 있어 재현의 윤리는 원본에 대한 무결성(integrity)을 유지하는 데 있다. 원저작자 의 예술적 의도와 표현이 축소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역사적·문화적 맥락까지 함께 담아 내야 한다. 특히 무용에서 움직임 표현은 존재론적 의미를 담고 있어 단순한 물리적 기록 을 넘어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에서 경험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Hannah 2002, 208).
이러한 맥락에서 재현의 윤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기술해볼 수 있다. 첫째, 기술적 재현 에서 비롯되는 왜곡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스트리밍, 데이터 변환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은 움직임의 세부적 질감과 신체성의 의미를 축소 시킬 수 있 으며, 이는 곧 원작의 의도와 감각적 경험을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소유와 접근 권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NFT를 통한 기록은 무용 기록물에 희소성과 소유권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기록의 공공성과 공유성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아카이브 설계자는 기록을 독점화하는 대신, 사회·문화적 가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권리 보호 를 실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재현의 윤리는 무용 기록을 단순한 보존물이 아닌 미래 지식의 문화적 자원 으로 보고 기록의 맥락과 의미를 존중하는 태도의 견지가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무용 기록물에 대한 보존, 교환가치, 재현의 윤리를 중심으로 무용 NFT의 가능성과 쟁점이 탐색 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첫째, 무용 NFT는 기록의 콘텐츠화를 가능하게 한다.
대체 불가능한 형태 미학을 구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 안에서 신체 움 직임을 물성화하는 작업은 실질적인 구현기술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무용 기록물의 경우 NFT 아트화가 거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무용 기록물의 가치와 희소성을 NFT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무용콘텐츠 중심의 플랫폼 확산은 무용 기록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 중 하나가 되어 무용의 문턱을 낮춰 대중성을 공략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 내용을 담아 NFT로 전시하는 기록의 콘텐츠 화는 무용 NFT의 이해도와 친밀감을 높이는 시도라 평가해 볼 수 있다.
둘째, NFT 기록물은 단순한 토큰을 넘어 문화적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K팝 댄 스의 경우 K-댄스 문화에 힘입어 콘서트 티켓부터 굿즈까지 플랫폼 내 댄스 영상이나 아 티스트의 이미지를 토큰화시켜 판매 중이다. NFT는 현재, 예술 영역은 물론 엔테테이먼트 산업으로까지 확산되어 메타버스와의 융합까지 시도하고 있다. 국립중앙 박물관의 뮤지엄 굿즈부터 창작자의 실물이 담긴 페이스 갤러리까지, 기존의 단순한 스트리밍 산업을 벗어 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상징물로서 희소성을 창출하고 있다.
셋째, 무용 NFT는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수익 배분을 통한 소유권을 보장하는데 용이하 다. 더불어 기존 무용 시장의 자본 쏠림 현상과 저작권 분쟁을 최소화하는 기록의 공공성 과 공유성을 살린 커뮤니티 토큰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무용 NFT는 수익성, 인지 도 측면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무용 기록물의 희소성과 소유권을 보장하면서도 상품화를 전제로 한 오마주 공정 이용의 법리적 규제도 필요하다. 다음은 도출된 NFT의 기술적 한계이다.
첫째, 에너지 소비와 장기 보존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NFT 시장은 중앙화된 구조와 오프체인(off-chain) 저장소가 불안정하게 연결되어있어 기록물에 대한 보존 리스 크가 존재한다. 둘째, 기록물에 대한 정보 체계가 표준화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록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는 법 적·윤리적 쟁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공연 영상의 경우 출연자와 스태프의 초상권, 저작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무용과 같이 기록물이 특정 공동체나 전통과 연결된 경우, 문화적 맥락을 침해하거나 상업적으로 완전히 전유 되어서는 안 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NFT는 무용 기록의 보존 및 진본성 검증에 있어 기존 중앙집중형 보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성숙도, 표준화, 에너지 효율, 법적·윤리적 틀 마련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무용 기록은 문화적 맥락을 배경으로 공간과 시간성에 대한 보존이 핵심이어서, 단순 파일의 토큰화를 넘어 보다 풍부한 기록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NFT 기 술이 무용 예술사의 새로운 무브먼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무용 기록물에 대한 문화 사적 논의의 출발로서 NFT가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