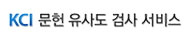Ⅰ. 서 론
한민족의 오랜 역사 속에서 계승되어 온 춤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형유산에 해당한 다. 그러나 근대 시기의 춤은 그 일부가 신문, 잡지, 영상 등 비물질적 매체에 기록되어 있어 자칫 유형유산으로 오인되기 쉽다. 이러한 기록물은 춤의 외형을 간접적으로 전할 수는 있으나 근대춤 역시 궁극적으로 신체를 통한 몸에서 몸으로 전승되지 않으면 원형이 단절되며, 결국 소멸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현시대에서 무형의 춤유산을 재현⸱복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대 무용가의 상상력을 바 탕으로 한 창작 행위이며, 새로운 안무라 할 수 있다. 이는 춤의 원형은 춤이 갖는 속성, 즉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다른 몸), 일회성, 순간성과 같은 특성을 지니므로 원형 그대로 의 재현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유행했던 근대춤 유산인 ‘신민요춤’을 중심으로, 그 재현과 복원과정을 실행연구(Practice-based Research) 방법을 통해 탐구하였다. 실행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창작 또는 복원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천을 기반으로 한 지식을 생 성하는 연구 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 근대무용의 선구자 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천안삼거 리」와 「도라지 타령」의 창작 담론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전통춤의 시대적 계승이란 점에 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한 과거 유산의 복원이 아니라, 민족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춤의 현대 적 계승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전통춤이 갖는 문화적 가치를 현대 사회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창작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배구자는 한국무용의 현대화를 이끈 인물로 그녀의 삶과 예술은 한국 무용사에서 중요 한 근대춤 유산으로 자리하며. 1936년 근대무용가 배구자가 발표한 신민요 음원에 맞추어 창작한 춤을 오마주하며 시작되었다. 그 기반이 된 자료는 2001년 자신의 100세 생일을 기념하여 한라함 무용학원을 방문했을 당시의 영상이다. 한라함 무용연구소가 위치한 하 와이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다. 이 영상 속에서 배구자는 학원생들 앞에서 한국의 민요 아리랑을 신무용화 한 창작무용 「아리랑」춤을 시연하며, 자신만의 춤 의 표현법과 특징을 이야기하였다. 이 영상 기록은 그만의 독특한 춤 동작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재생산 작업의 중요한 기초자료이자 토대이며, 본 실행연구의 시작점이 되 었다. 이와 같은 토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천안삼거리」와 「도라지 타령」에 대한 재현⸱복원을 구상하였다. 원형의 흔적과 전형의 요소를 결합하여, 동시대적 감각으로 창작 안무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근대춤 유산을 재해석하는 실천적 작업으로 의미가 크다. 또한 배구자의 춤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증언도 본 연구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한 라함의 후계자 메리 조 프레슬리(Mary Jo Freshley) 원장과 그 제자들은 배구자의 춤동작 이나 춤의 걸음걸이에서 일본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하였다(유화정, 2019). 실제로 메 리조 프레슬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술채록사업 당시 한국 근대무용의 선구자인 배 구자의 「아리랑」 춤을 시연하여 그의 흔적을 보여 주었다(최해리 2020, 79). 이러한 모든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본인의 근대춤에 대한 재현⸱복원과정을 반추하면서 무형 의 춤유산이 갖는 가치, 그리고 전통춤의 재현⸱복원이라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실행연구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배구자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역사적 흐름분석(김기화 2015, 김동미 2013, 김시정 2007, 전은자, 이재연 2005), 서양무용의 수 용과 변용양상(김호연 2019), 공연사례·레파토리 분석(김남석 2016), 생애 및 예술활동(김 효진 2016), 촉첩(觸接)연구를 통한 배구자의 춤(서고은, 김경희 2022) 연구 등으로 분류 된다.
본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조사를 통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둘째, 배구자의 공연활동 영상, 인터뷰, 영상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등 을 수집하여 배구자의 춤에 대한 가치관과 춤의 표현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 2001년 자신의 100세 생일을 기념하여 하와이에서 촬영된 한라함 무용학원을 방문했던 배구자 하 와이 영상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춤의 움직임의 특징을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신 민요 음악의 가사를 정리하고, 배구자의 춤의 특징을 반영하여 「천안삼거리」와 「도라지 타령」의 창작 안무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배구자의 생애와 작품관에 대한 기록적 고찰에 그치지 않고 연구자가 직접 창작하고 공연한 두 작품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배구자의 신민요춤의 재현과 복원하는 실행 과정을 통해, 동시대적 계승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국 근대무용 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동시대적 맥락에서도 지속가능하게 계승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특히, 민족적 정체성과 지역성이 반영된 배구자 작품의 재해석은 무형유산으로서의 전통춤의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하고 무 용예술의 창작적 재생산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전통춤의 현대적 재생산과 다양한 담론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Ⅱ. 배구자의 생애와 작품세계
1. 배구자의 생애
배구자는 구한말의 요화(妖花) 배정자(裵貞子)의 조카이며, 12세에 조선 공연에 온 쇼우 교구사이덴까스(松旭齊天勝)의 덴까스곡예단(天勝曲藝團)에 입단하였다. 덴까스곡예단의 프로그램은 무용, 음악, 곡예, 연극, 가극이었고, 송욱제귀자(松旭齊龜子)라는 예명을 받을 정도로 기예가 성장했으나, 1926년에 평양 공연 후 경성으로 도망하였다. 홍순언(洪淳彦) 과 결혼하였고, 1928년 장곡천정공회당에 올린 음악무용대회는 조선인 최초의 무용공연이 었으며, 이때 발표한 「아리랑」이 큰 호응을 얻었다. 1929년 배구자예술연구소를 설립하여 단원들을 교육하였고, 1930년 배구자무용가극단일행은 일본의 흥행사를 통해 일본에서 활 동했다. 조선춤의 무대화를 위해 「파계」, 「물깃는 처녀」, 「방아타령」 등의 작품을 발표했으 나, 1931년을 기점으로 악극이나 레뷰무대에 중심을 두었다.
1935년에 홍순언과 함께 회전무대와 호리존트를 갖춘 당시로는 최신식의 동양극장을 지었고, 전속극단 청춘좌, 희극좌, 동극좌, 호화선을 운영하며 일제강점기 후반의 대중극을 일으켰다. 레파토리는 노래, 소규모 관현악, 레뷰춤, 가극, 만극 등 대중적 취향의 것이었다.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다 광복 후 일본에 정착하며, 전혀 활동하지 않았다. 말년 에 하와이에서 거주했고 98세로 일생을 마쳤다. 배구자의 춤은 조카이며 배구자가극단의 단원이었던 배한라(裵漢拏, 1922∼1994)에 의해 하와이에서 전수되었고, 하와이대 한국학 연구소에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다.(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녀의 예술 활동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게 단순한 무용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극장 운영자, 교육자, 공연기획자 등으로 확장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특히 그가 중심이었던 동양 극장에서 기획한 종합예술 공연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한 사례로 기록되며, 그 녀의 공연 포스터, 무대 사진, 당시 신문 광고 등은 현재 귀중한 문화사적 사료로 간주 된다. 또한 그녀는 근대 시기의 성별 역할과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은 여성 예술가로, 한국 근대 여성 예술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로 평가받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배구자의 경력 중 특히 주목할 점은 그녀가 단순히 무용의 무대화에 머무르지 않고, 한 국 무용계 전반의 구조를 혁신하려 했다는 점이다. 동양극장의 운영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 예술가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문화자본 형성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단순한 무용 예술가가 아닌 한국 근대예 술 전반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였다.
2. 배구자의 창작 정신
배구자는 서양무용의 기법을 도입하면서도 그 내용면에서는 민족적 정서를 담아내는 창 작을 실천하였다. 대표작 「아리랑」은 민요의 리듬과 정서를 현대적 안무로 해석하여 근대 무용사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녀의 춤은 구조와 동작에서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표현 방식은 근대적 감각을 반영하였다. 이는 단순한 재현이 아닌 새로운 창작의 영역으로 한국 춤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한 면모였다. 배구자의 「아리랑」은 기사. 매일신보의 배구자악 극단의 1936년 6월 경성 부민관 공연, 리플렛, 1937년 배구자악극단의 일본공연(아리랑 아카이브 사이트), 구술채록, 메리 조 프레슬리: 한국근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200 (아르코예술기록원 사이트), 영상, 메리 조 프레슬리의 「아리랑」 시범 영상(한국춤문화자 료원)등 연구자료에서 그의 창작정신이 기록되어 있다(최해리 2020, 77-79).
또한 배구자는 자신의 무용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하였고, 공연의 서사성과 무대 구성을 철저히 설계하여 ‘보여주는 춤’을 넘어 ‘전달하는 예술’로서의 춤을 구현하였다. 그 녀의 춤은 단순한 오락 이상의 기능을 가졌으며, 민족 정체성과 시대 의식을 반영하는 예 술 형태로 승화되었다.
그녀의 안무는 전통민요의 내러티브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창작되었으며, 민 속성과 근대성의 경계에서 한국 춤의 정체성을 고민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그녀가 사용한 움직임 중 많은 부분은 일상적 동작을 춤의 언어로 승화시키는 방식으 로 구성되어, 관객에게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인상을 제공한 점에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용 예술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지역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한 안 무 세계를 형성하였다.
Ⅲ. 신민요춤의 역사적 맥락과 재현 복원과정
신민요춤은 1930년대 대중가요와 방송 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민속무용의 새로운 장르 로 부상한 춤이다. ‘신민요춤’이라는 용어는 ‘민요’와 ‘춤’을 합친 ‘민요춤’이라는 용어에서 2020년 무용역사기록학회가 (재)전통예술진흥재단의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된 학술발표에서 처음 제시되는 용어이다(최해리 2020, 75). “우리나라 민요에 맞춰서 추는 춤의 형태”라는 것이 일반적임을 정의하였고, 이는 일제강점기에 유성기 음반 의 발달로 신민요가 유행하면서 이 노래에 맞춘 신민요춤도 산실되게 된 것이다. 기존의 농경사회 중심 민속춤과 달리, 신민요춤은 도시 대중의 정서와 유흥 문화를 담아내며 빠른 리듬과 감각적인 움직임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아리랑」, 「처녀총각」, 「군밤타령」, 「늴리리야」, 「도라지타령」, 「노들강변」, 「천안삼거리」 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 작품들은 193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서구적 안무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신무 용 공연의 경우 그 반주 음악으로 양악(洋樂), 그중에서도 주로 서양의 클래식 음악 소품들 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시기는 한국 근대무용가들이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의 전근대적 재래무용과 20세기 이후 서구 혹은 일본을 통해 전래된 신무용(新舞踊)이 당대의 민족문화운동과 결부되어 새롭게 기획된 ‘한국적’인 공연 예술로 정착해 갔던 시기였다. 그렇지만 배구자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아리랑」, 「천안삼 거리」, 「도라지타령」 등의 민요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춤을 창작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 체화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대표적인 두 무용가인 배구자와 최승희(崔承喜, 1911-1969)의 발언들에 서 알 수 있듯, 근대 한국무용의 정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여명기에 있어 무용공연과 유성기 음반(혹은 유성기의 사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그렇지만 이는 분단과 전쟁 등 근현대 한국 사회의 격변 속에서 한국에서 제작된 다수의 음반과 영화가 소멸되었 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이들 매체의 자료적 가치에 대한 저간의 인식 부족으로 많은 자료 가 산실되고 멸실된 점에서 아쉬움이 존재하였다(석지훈 2020, 43).
그럼에도 현존하는 이들 음반 및 영화 자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신문, 잡지, 기사 등 당대 문헌 자료의 검토와 분석만으로도 글과 사진 등의 매체를 통해 기록되기 어려웠던 당대 한국무용의 역사적 실체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배구자 또한 창작 의 바탕을 여러 음악, 특히 음반을 기초로 하였고, 이것이 창작의 원천임을 밝힌 바 있다.
“네, 日本의 등간정강(騰間靜江)이가 고유의 日本舞踊에다가 西洋딴스를 가미하여 새로운 춤을 지어 내지 안엇서요. 그 모양으로 저도 조선춤에다가 洋式을 조곰 끼어너허서 빗잇든 그 조선예술을 시대적으로 부흥식히고 십담니다. 그러치 안으면야 불이야 불이야 춤공부가 무에 임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念佛」을 무용화해보려고 생각하는 중이람니다. 우리 민용에 웨요 念佛曲이란 것이 잇지안어요. 바로 이거야요. (하며 山念佛曲을 축음기에 너허튼 다.) (「배구자의 무용전당, 신당리문화촌의 무용연구소 방문기」, 「삼천리」제2호 1929.9. 144쪽)
이러한 모티브를 바탕으로 배구자의 신민요춤을 재현·복원이 가능하도록 유성기의 음반 안의 음악을 복구하여 음악으로 재현하였고, 본질을 간직하면서 배구자가 추구한 방법론 이나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재생산을 추구하였다.
1. 배구자의 신민요춤 재현·복원에 근거한 창작 실행과정
연구 방법은 실행연구로 순환적 과정을 통해 선행연구를 통한 정보와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을 통해 최종 재현 복원 창작과정으로 작품을 완성하였다. 우선 문제점 인식 → 계획 수립 → 실행 → 관찰 및 평가 → 반성 및 수정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며 작품을 발전시켰다. <표 1>에 실행연구과정을 정리하였다.
표 1
실행연구과정(재현⸱복원에 근거한 창작과정) Practice-based research process (a creative process based on reenactment and restoration)
| 단계 | 내용 | 결과물 | ||
|---|---|---|---|---|
| 1 단계 | 문헌 기반 분석 문헌 기반 분석 | 자료 수집 |
|
이론적 기반 정립 |
| 2 단계 | 영상 자료 분석 |
|
핵심특징 도출 | |
| 3 단계 | 실행 기반 과정 실행 기반 과정 | 창작 안 확립 | 자료수집과 영상자료 분석을 통한 움직임의 특징을 도출하여 신민요 음원의 가사를 분석하여 움직임으로 표현함 | 창작작품 완성 |
| 4 단계 | 작품 수정 및 보완 | 작품영상 녹화 후 분석 | ||
| 5 단계 | 실행 과정 | 무대 공연 실연 | <표 3> 을 통해 무대화 과정을 정리 제시함 | |
| 6 단계 | 평가 과정 | 평가 | 배구자의 신무용 기법에 적합한 작품 재현 및 복원에 의한 창작작품으로 평가됨 | 페이스북 및 SNS의 의견 |
표 2
배구자의 신민요춤 창작 작품 무대공연 실행 과정 (Performance Practice Process of Bae Gu-ja’s New Folk Song Dance Works)
| 과정 1> 신민요춤 권려성의 ‘닐늬리야’ 재현과 복원 |
 |
2020년도 무용역사기록학회의 (재) 전통예술진흥재단의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지원을 받아 진행된 학술발표회와 무용공연에 참여한 신민요춤을 통한 실천연구의 단초이다. 1960년에 제작된 문화영화에 남아 있는 권려성의 신민요춤을 재현·복원하는 작업으로 한국 근대음악 ‘닐늬리야’ 음원에 맞추어 재현·복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작의 의미와 감각에 동시대적 감각의 음악과 안무 동선에 따라 새롭게 창작 안무하였다. 이 공연의 참여가 배구자의 신민요춤 안무의 단초가 되었다. |
| 과정 2> 배구자의 신민요춤 ‘천안삼거리’‘도 라지타령’재현 과 복원을 통한 창작화| 1차 공연 |
 |
2024년 국립정동극장 ‘세실풍류: 법고창신, 근현대 춤 100년의 여정’ 개최(정성숙 대표이사)기획공연에 참여하였다. 공연의 취지는 1920년대 서양 문화의 도입과 함께 우리 민족의 고유 정서를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한 신무용을 다룬다는 취지였다. 특히 신민요‘아리랑’을 우리나라 최초로 무대화하며 신무용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배구자의 신민요춤 개막으로 공연이 개최되었다. 연구자는 배구자의 신민요춤을 안무하여 무대에 올린 첫 번째 공연이다. |
| 과정 3> 배구자의 신민요춤 ‘천안삼거리’‘도 라지타령’ 재현과 복원을 통한 창작화 | 2차 공연 |
 |
2024년 6월 보훈예술무용협회 류영수 이사장의 기획으로 근대춤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취지의 ‘세월을 가진 춤을 추다’ 국립 하늘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에 출연하였다. |
| 과정 4> 배구자의 신민요춤 ‘천안삼거리’‘도 라지타령’ | 3차 공연 |
 |
보훈예술무용협회 류영수 이사장의 광복 100주년 기념의 공연기획으로 나루아트 대극장에서 세 번째 출연으로 참여하였다, |
Ⅳ. 결과 및 작품분석
배구자의 신민요춤 「천안삼거리」, 「도라지타령」은 배구자의 신민요 음원에 맞춰 창작되 었으며, 음악의 분위기와 가사에 따라 서사적 구성을 달리하였다. 동작은 전통춤의 기본 동작을 유지하면서 상체의 움직임이나 호흡의 리듬은 자유롭고 즉흥적인 표현을 중시하였 다. 특히 영상과 증언 등 원천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배구자의 춤의 특징은 극적인 표현과 걷는 듯한 걸음걸이, 섬세한 발 스텝이 특징적임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권려성의 ‘닐니리 야’ 버전을 재현한 경험에 이어 배구자가 민요 「천안삼거리」와 「도라지 타령」에 바탕을 두어 창작한 신민요춤을 재현과 복원을 통한 작품의 재생산 과정을 살피며 창작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한국춤문화자료원 최해리 이사장의 영상자료 제공으로 한 라함 학원의 발표회 영상과 배구자 생전의 ‘아리랑’ 시연 영상, 그리고 메리 조 프레슬리의 증언 자료를 근거로 안무의 흐름과 특유의 손동작, 걸음걸이와 스텝의 리듬을 재현하였다. 음악은 유성기 음반 속 음악을 석지훈 연구원의 작업 과정을 통해 조금은 관람자가 듣기 가능하도록 제공해주었다. 보통 라이브 연주는 경서도 소리꾼 외 국악과 양악 연주자가 혼합된 신민요 반주단(악기편성: 장구, 아코디언, 색소폰)이 담당하여 진행되었었으나 이 번 음원은 기존 배구자의 가창이 담긴 유성기의 음악을 복원한 것이다. 의상과 무대 구성 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되는 등 본 작업은 단순 복원이 아닌 창작과 재현의 경계에 서 있는 동시대적 실행으로 의미를 지닌다.
1. 천안삼거리
「천안삼거리」는 고전 민요의 구조적 반복성을 활용해 가사에 따른 표현적인 동작과 반 복적인 동작을 조화롭게 구성하였다. 작품의 시작은 무대 뒤 배구자의 사진을 영상으로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연출하였고, 행위자는 배구자와 똑같은 동작으로 첫 포즈를 취하여 마치 벽화 속의 배구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듯한 표현을 구현하였다, 이렇게 무대 상수에서 영상 속의 배구자의 모습과 무대 위의 무용수의 포즈가 오버랩되어 음악 전주곡이 시작되 며 춤이 시작된다.
이 작품은 ‘신민요춤’이라는 형식 자체가 단순히 새로운 음악에 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춤을 통해 음악의 가사에 따른 정서를 재해석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시각화하려는 예술적 시도라는 점을 보여준다.
천안삼거리(天安三巨里)는 굿거리장단에 맞춰 흥겹게 부르는 노래로 그 흥겨움을 표현 하는 가사 “흥”이라는 후렴구 때문에 「흥타령」이라 부르기도 한다. 원음은 최승희와 쌍벽 을 이루던 신무용가 배구자가 1936년 7월에 포리돌레코드에서 배구자악극단(裵龜子樂劇 團), 소녀합창단(小女合唱團)과 같이 부른 민요이며, 음악 자료의 출처는 석지훈 연구원의 유성기 음반 안에 음원을 복원한 음원이다.
본 작품은 2024년 6월 28일 ‘2024 보훈무용제-세월을 가진 춤을 추다’ 공연에서「배구 자의 신민요춤」구간 영상(30분-37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작품 안무는 연구자가 최해리(사단법인 한국춤문화자료원 이사장)가 제공한 자료와 석 지훈(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제공한 음악을 토대로 연구하여 완성하였다.
표 3
천안삼거리 작품 내용과 무보(Content and Dance Notation of Cheonan Samgeori) 세월을 가진 춤을 추다. 2024년 6월 28일. 국립극장 하늘극장. 30분~37분. https://youtu.be/Nrsbi48S3Ak)의](https://youtu.be/Nrsbi48S3Ak%29
| 00’00”-00’18” |  |
배구자와 하나가 됨을 연출하기 위해 사진과 똑같은 포즈를 취하며 작품이 시작된다. 영상과 무용수만 보여지도록 핀(pin) 조명이 들어 오고 천안삼거리 리듬이 흐르며 배구자가 되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
| 1소절 00’19”- 0’29” |
 |
(가사 1) 천안삼거리 흥~ 흥, 능수나 버들은 흥 (동작 1) 음악에 맞춰 움직이며 무대 중 앙을 바라보며 음악의 박자에 맞춰 원 스텝을 하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들어 온다. |
| 00’29”-00’39” |  |
(가사 2) 제멋에 겨워서 흥~ 흥, 축 늘어졌구나 흥 (동작 2) 배구자의 연극적 춤의 특징이 있어 가사 ‘축 늘어졌구나’을 동작으로 표현하였다. |
| 00’39”-00’49” |  |
(가사 3) 에헤야 노아라 흥~ 흥, 성화가 났구나 흥 (동작 3) 무대 뒤로 음악 리듬에 맞춰 투스텝과 팔 동작을 하며 ‘에헤야 노아 라’ 의 밝고 경쾌한 리듬을 표현하였다. |
| 반복 후렴 리듬 1 00’49”-01’08” |
 |
4박자의 힘찬 악기음과 경쾌한 리듬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무용수의 움직임이 정면과 뒷모습의 연출, 팔 동작을 크게 활용한 동작으로 표현하였다. |
| 2소절 01’08”-01’17” |
 |
(가사 1) 인천의 제물포 흥~ 흥. 살기는 좋아도 흥 (동작 4) 인천이라는 지역의 가사 표현 을 위해 뒤꿈치를 들고 물을 건너는 듯 한 발동작, 흔들리는 팔의 움직임, 그물 로 물고기를 잡는 듯함을 표현하였다. |
| 01’17”-01’27” |  |
(가사 2) 미두꾼 등쌀에 내 못 살겠누나 흥 (동작 5) ‘못 살겠구나’를 표현하기 위해 조금은 서글픈 표정과 동작으로 표현하 였다. |
| 01’27”-01’37” |  |
(가사 3) 에헤야 놓아라 흥~ 흥, 성화가 났구나 흥 (동작 6) 배구자의 섬세하고 보폭이 좁 은 걸음걸이의 춤의 특징을 살려 치마를 잡고 발 스텝이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
| 반복 후렴 리듬 2 01’37”-02’00” |
 |
4박자의 경쾌한 음악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무용수의 정면과 뒷모습의 연출, 팔 동작을 크게 활용한 동작으로 표현하였다. 이때 똑같은 후렴 리듬에 똑같은 동작으로 반복 표현하였다. |
| 3소절 02’00”-02’11” |
 |
(가사 1) 세월아 네월아 흥~ 흥, 가지를 말아라 흥 (동작 7) 왼손을 오른쪽 뺨에 가져다 대 면서, 오른손은 치마를 잡고 오른발로 감으면서 두 바퀴 회전하며 좌측으로 이 동한다. |
| 02’11”-02’20” |  |
(가사 2) 꽃다운 청춘이 흥, 다 늙어 가느나 흥 (동작 8) 왼손에 치마를 잡고 허리춤 뒤 로,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좌우세하며 앞으로 전진한다. |
| 02’20”-02’30” |  |
(가사 3) 에헤야 노아라 흥, 흥 성화가 났구나 흥 (동작 9) 센터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왼 손은 치마를 잡고 45도 각도로 올리고, 오른쪽 손은 동일한 선상에 있다. 시선 은 무대 중앙보다 위쪽을 바라보며, 세 월이 가고 늙어감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 아 서글픈 표정이 관객과 공감되도록 표 현하였다. |
| 반복 후렴 리듬 3 01’37”-02’00” |
 |
4박자의 후렴구의 경쾌한 음악에 맞춰 무대 원을 그리는 공간구성으로 후렴구의 리듬을 최대한 표현하였다. |
2. 도라지타령
본 작품은 2024년 6월 28일 보훈무용제 기획으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 ‘세월 을 가진 춤을 추다’ 공연에 출연한 영상에서 30분~37분 구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원 음은 최승희와 쌍벽을 이루던 신무용가 배구자가 1936년 7월에 포리돌레코드에서 배구자 악극단(裵龜子樂劇團), 소녀합창단(小女合唱團)과 같이 부른 민요이며, 음악자료의 출처는 석지훈 연구원의 유성기 음반 안에 음원을 복원한 음원이다.
안무가는 배구자의 신민요춤의 흐름과 구성을 오마주하며, ‘도라지타령’ 민요의 빠른 장 단과 정서를 섬세하게 해석하였다.
창작 작품은 가사 내용을 표현해내는 동작으로 구성하였는데, 낮잠을 자는 듯한 움직임, 발동작을 강조한 스텝 동작, 치마의 날림을 활용한 동작 등 배구자의 춤에 대한 가치관이 담긴 대표 동작을 인용하였으며, 신민요춤의 특징으로 연극적인 표현과 발동작의 다양함 을 강조하였고 신민요 가사를 마치 표현한 듯한 동작으로 안무하였다.
의상은 천안삼거리와 도라지 타령의 가사가 마치 노동요적인 요소가 많아 마을 처녀를 연상하게 하는 치마와 저고리로 선택하여 한국적인 의상표현을 강조하였다. 보라색 계열 의 저고리와 다홍치마로 구성되어 당시 젊은 여인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소품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도라지 타령에는 도라지꽃을 소품을 활용하여 도라지 캐러 간다더니 가 사에 맞게 표현하였다.
무대 조명은 따뜻한 백색 톤으로 햇살 좋은 봄의 정서를 부각시킨다. 관객의 정서에 호 소하는 나레이션과 표정 연출은 신민요춤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배구자 특유의 동작구조, 예를 들어 가사를 표현하는 듯한 동작과 마임적 요소가 강한 얼굴표정, 발동작의 다양한 스텝, 들판을 뛰어다니는 듯한 점프 동작 과 도라지꽃을 꺾는 듯한 표현동작, 상체를 낮추며 진행하는 동선, 좌우 회전 동작, 이는 단순한 외형적 모방이 아닌, 그녀의 작품세계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 되어 있다. 안무가는 춤의 호흡, 시선 처리, 움직임의 연결 구조를 통해 ‘재현을 통한 창조’ 를 성취하고 있다.
표 4
「도라지타령」 무보와 작품 내용(Content and Dance Notation of Doraji Taryeong) ‘세월을 가진 춤을 추다’ 2024년 6월 28일. 국립극장 하늘극장. https://youtu.be/Nrsbi48S3Ak%29
| 전주 음악 00’00”-00’08” |
 |
무대 중앙 앞에 놓여 있는 도라지꽃을 멀리서 바라보듯 무대 중앙 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 전주 음악 00’08”- 00’10” |
 |
도라지꽃을 발견하고 꽃을 향해 전진한다. 이때 배구자의 섬세한 발의 표현의 특징을 살려 스텝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
| 1소절 00’10”-00’19” |
 |
(가사 1) 도라지 캐러 간다더니 요핑게 조핑게 다 대더니 (동작 1) ‘요핑게 조핑게’를 표현하기 위 해 조금 삐진 듯한 표정과 리듬에 맞추어 치마를 크게 앞뒤로 휘두른다, |
| 00’18”-00’28” |  |
(가사 2) 뒷 동산에 홀로 낮잠만 자고 있더라 (동작 2) ‘낮잠만 자고 있더라’ 가사 표현 을 위해 상체를 최대한 뒤로 젖혀 자고 있는 듯한 표현을 위해 왼손을 얼굴 눈가 에 대고 잠결에 눈을 비비는듯한 동작으 로 표현하였다. |
| 00’29”-00’42‘’ |  |
(가사 3) 에헤요 에헤요 에헤요 에에 난다 지화자 // 아이고나 내 사랑아 ~ (동작 3) 양팔을 크게 벌렸다, 사람을 잡 는 듯, 안아 주는 듯한 동작으로 표현하 였다. |
| 반복 후렴 리듬 1 00’43”-01’03” |
 |
후렴구의 경쾌한 리듬에 맞춰 들판을 돌 듯 무대 동선을 라운드로 돌며 표현하였다. |
| 2소절 01’04”-01’12” |
 |
(가사 1) 도라지 캐러 간다더니 // 요핑게 조핑게 다 데더니 // (동작 4) 도라지를 땅에서 캐듯 팔동작을 하며 도라지 꽃을 쥐어 든다. |
| 01‘12”-01’20” |  |
(가사 2) 총각 낭군 못 오매 (동작 5) 도라지 꽃을 어깨에 둘러메고 투스텝을 발동작으로 표현하였다. |
| 01’21”-02’24‘’ |  |
(가사 3) 에헤요 에헤요 에헤요 에애 난다 지화자 // 아이고나 내 사랑아 ~ (동작 5) 사선 방향으로 앞으로 뒤로 투 스텝을 하며 갈 듯 말 듯 한 동작으로 표 현하였다. |
| 반복 후렴 리듬 2 02’25”-02’38” |
 |
도라지 꽃을 들고 경쾌하고 큰 동작으로 표현하였다. 도라지타령의 후렴구의 동작은 천안삼거리 작품의 후렴구와는 달리 반복 동작이 아닌 동일한 리듬이지만 각기 다른 동작으로 표현하였다. |
| 3소절 02’01”-02’08” |
 |
(가사 1) 도라지 캐러 간다더니, 요핑게 조핑게 다 데더니 (동작 6)도라지 캐러 간다 더니의 가사를 살려 길의 표현 연출을 위해 무대 상수에 서 중앙으로 가로 동선을 활용하여 도라 지 꽃을 캐러 간다더니를 표현하였다 |
| 02’09”-2’18” |  |
(가사 2) 물방앗간 뒤 죽여라 살려라 (동작 7) ‘줄여라 살려라’ 가사를 표현하 기 위해 뒷걸음으로 밀려나듯 한 스텝으 로 표현하였다. |
| 02’19”-02’31” |  |
(가사 3) 에헤요 에헤요 에헤요 에애 난다 지화자 // 아이고나 내 사랑아 ~ (동작 8) 꽃바구니를 들고 사선 앞뒤고 움직이며 도라지를 캐어 바구니에 담았 음을 표현하였다. |
| 반복 후렴 리듬 3 02’31”-03’15” |
 |
도라지를 캐든 꽃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다시 처음 포즈와 똑같이 배구자와 오마주하였다. |
Ⅴ. 결론
본 논문은 근대춤 유산인 배구자의 신민요춤을 실행연구 방식으로 재현·복원한 과정을 중심으로, 무형유산의 재생산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 배구자는 일본 화된 신무용과는 구별되는 한국의 전통과 서양 춤의 요소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근대무 용의 선구자로 평가될 수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28년 4월 28일 배구자 무용발표에서 발표된 작품 「아리랑」은 한국의 전통민요 를 바탕으로 서양 춤의 요소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식민지 시기 억압된 민족 정체성을 예술로 표출한 저항적 행위로 읽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라지 타령」의 노동요적 요소를 무대화하며, 민족적 서사를 대중과 공유하였으며, 배구자는 이처럼 한국 근대무용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서, 서양무용과 민족정서를 융합한 독자적 안무 세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그녀의 신민요춤은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현대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재창작되어야 할 살아 있는 유산임을 본 연구는 보여준다.
둘째, 「천안삼거리」와 「도라지 타령」을 무보화의 실행연구로 배구자가 부른 신민요 음 악에 맞춰 그녀의 예술관과 춤에 대한 가치관을 연구하여 재현·복원 창작화 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신민요춤, 천안삼거리와 도라지 타령은 서양식 악기로 음악이 연주되어 졌고, 연극적 표현이 강한 춤의 특징이 있었다. 또한 지역을 호칭한 천안삼거리는 충청도 지역의 민요라는 점과 도라지타령은 전라도 방언과 정서를 반영해 지역성을 탐구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향후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있어, 이와 같은 실천 중심의 접 근 방식의 연구가 제도적·학문적으로 확산할 필요성을 밝힌 점에 가치가 있다. 특히 춤의 재현은 단순한 복원이 아닌 창작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전통춤의 지속가능성과 동시대성과의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신민요춤의 동시대적 계승 가능성을 제시 함으로써, 한국춤의 민족성, 정체성, 지역성에 관한 담론을 확장하는 데 의의를 둔다.